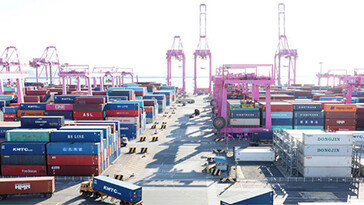■ 스플릿그룹B 미디어데이…두 감독의 어색한 만남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듯 영 불편했다. 얼굴엔 당혹감이 가득했다. 종종 옅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더 어색했다. 성남 일화라는 같은 끈을 지닌, 공교롭게도 같은 절박함에 놓인 성남 신태용 감독과 강원 김학범 감독이 그랬다. 성남은 K리그 7번 우승한 최다 우승팀이다. 그 중심에 신 감독과 김 감독이 있었다.
1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K리그 그룹B(9∼16위) 미디어데이. 화기애애한 예전 기류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쉬움과 부담만 가득한 분위기. 당연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영광 대신 아픔을 품은 이들이었다. 정규리그 30라운드에서 하위권으로 밀려난 사령탑들은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
이런 상황은 상상할 수 없었다. 성남은 승점 37로 11위, 승점 25의 강원은 꼴찌로 그룹B로 내몰렸다. 이제 아무리 잘해야 9위가 순위 꼭대기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애써 쾌활함을 잃지 않으려 주변에 농을 던지는 신 감독에게는 쓸쓸함이 묻어났다. 잠시 행사장을 빠져나온 김 감독이 쉼 없이 입으로 가져가던 줄담배는 타는 속을 대변했다.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수확이 1부 리그 생존이라는 점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다. 그래도 포기는 없다. 친정팀 지휘관 신 감독에게 올 시즌은 최악의 기억. “홈에서 너무 많이 졌고, 골도 많이 못 넣었다. (지금의 아픔은) 남 탓이 아닌 전부 우리 탓”이라던 그는 제자들에게 남은 14경기 중 10승 이상을 주문했다. 휴가 연장이란 달콤한 포상과 휴가 단축이라는 처절한 응징이 성남 선수단을 기다린다.
공교롭게도 김 감독은 K리그 승강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온 예찬론자. 성남을 이끌던 시절 그는 입버릇처럼 “프로축구 발전을 위해 1, 2부 리그 운영과 승강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젠 자신이 첫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더욱 머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