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가 미래의 레전드에게]<5>박기원 배구 대표감독-박철우

“누가 보면 철우와 감독님이 원수인 줄 알 것 같아요.”
한국 남자배구대표팀의 세터 한선수(29·국방부)는 동갑내기 친구이자 대표팀의 에이스 박철우(29·삼성화재)를 안쓰럽게 바라봤다. 대표팀의 박기원 감독(63) 때문이다. 대표팀의 훈련장인 충북 진천선수촌과 각종 국제대회에서 박 감독은 ‘박철우’를 입에 달고 산다.
박 감독은 훈련 때나 경기 때 “철우. 그것밖에 못해”, “좀 더 집중해야지”, “정확하게 공을 봐야지” 등의 주문을 쏟아낸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플레이를 펼치면 망설임 없이 박철우를 벤치로 불러들인다. 한국 최고의 공격수로 불리는 박철우로서는 박 감독의 쓴소리가 불만일 법도 하다. 하지만 박철우의 생각은 달랐다. “다 저 잘되라고 감독님이 쓴소리를 많이 하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잘해야만 팀이 살아난다는 것도요.”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있는 박 감독은 아시아경기와 인연이 깊다. 직접 선수로 뛴 1978년 방콕 아시아경기에서 센터로 맹활약하며 한국의 우승을 이끌었다. 24년 뒤인 부산 아시아경기에서는 이란 남자배구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아 은메달을 따냈다. 박 감독은 “금메달을 땄을 때의 기분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박철우도 세계적인 선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7월 대표팀이 소집된 뒤 박철우는 박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부진으로 연습경기 때도 벤치를 지킬 때가 많았다. 지난달 끝난 아시아배구연맹 남자배구대회에서도 한국은 무패로 우승컵을 안았지만 박철우는 좀처럼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하며 박 감독의 애를 태웠다. 전광인(23), 서재덕(25·이상 한국전력) 등 젊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아시아경기에서는 박철우가 활약을 해줘야 한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박철우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박 감독은 가지고 있다. 박 감독은 “서재덕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지만 아직 에이스가 아니다. 전광인도 아직 해결사로 뛰기에는 부족하다”며 “결국 아시아경기 등 중요한 경기에서는 박철우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에서 동메달에 그쳤던 만큼 이번 아시아경기에 나서는 박철우의 각오는 남다르다. 박철우는 “아시아경기에 목숨을 걸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절실하다. 4년 전에는 병역면제 등의 문제로 다급했고 욕심만 부렸던 것 같다. 지금은 대표선수로서, 운동선수로서 명예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금메달 감독님 밑에서 금메달 선수도 나올 것 같다”며 웃었다.
진천=김동욱 기자 creating@donga.com
레전드가 미래의 레전드에게 >
구독 0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127
-

횡설수설
구독 255
-

베스트 닥터의 베스트 건강법
구독 82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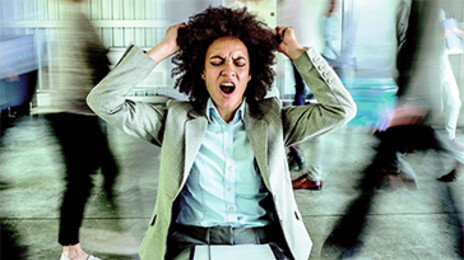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