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염경엽 감독(46)이 바로 그 ‘과장’이다. 고려대를 졸업하고 1991년 프로에 데뷔한 염 감독은 2000년 현대에서 은퇴한 뒤 구단 프런트 직원으로 일했다. 염 감독은 4일 한국시리즈 1차전을 앞둔 대구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헐레벌떡 호텔에 도착해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우승 장면이 담긴 동영상 만들고 나서 한숨 돌리려고 밖에 나왔다. 그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슬펐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은 딱 초라함이었다. 그때는 자신에게 투자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라운드라는 생각이 간절했다”며 “그래도 그때 다양한 경험을 한 덕에 계속 (여러 구단에서) 선택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스타 선수 출신인 삼성 류중일 감독(51)의 포스트시즌 추억은 염 감독하고 많이 달랐다. 그는 여전히 최장 기록인 포스트시즌 4경기 연속 홈런을 때린 1991년 준플레이오프를 회상하면서 “홈런 치면 치약을 줬는데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아서 처치 곤란이었던 게 기억난다”며 웃었다.
그러나 이날 경기가 끝난 뒤 스타 출신감독은 한숨을 내쉬었고, 10년 전 한숨을 짓던 과장은 웃었다.
대구=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라커룸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프리미엄뷰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130
-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메디컬 리포트
구독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0개
![[라커룸]나바로 ‘소사 이발소’ 다녀오면 힘솟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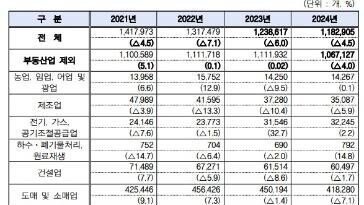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