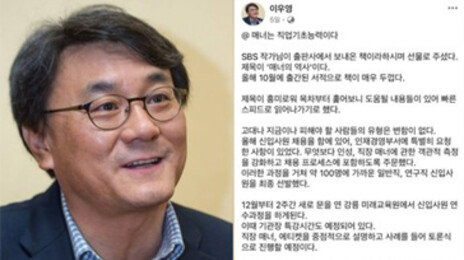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수원 서정원 감독
끊임없는 자극으로 선수들 오기 끌어내
활동량·슛정확도 높여 재미있는 축구로
출퇴근때도 피아노연주 들으며 훈련구상
“수원다워졌다” 문자받고 스트레스 훌훌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 마음의 울림…, 오고 싶은 팀으로!
예나 지금이나 수원은 축구선수라면 누구나 뛰고 싶은 팀이다. 물론 그 때와 지금은 크게 다르다. 과거에는 후한 대우를 보장해 ‘레알 수원’으로 불렸지만, 요즘은 정반대다. 모기업이 제일기획으로 바뀌고, 긴축재정에 돌입했다. ‘연봉 1등’, ‘수당 1위’ 따위는 잊은 지 오래다. 그런데도 수원은 매력적이다. 분위기 때문이다. 서로를 믿고, 이끌고, 따른다.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대화한 결과다. ‘초승달 눈웃음’이 트레이드마크인 서 감독도, 코치들도 선수들에게 화낸 적이 없다. 그 대신 끊임없는 자극으로 마음 속 오기를 이끌어낸다.
언젠가 지독하게 답답한 경기를 본 서 감독은 하프타임에 딱 한마디를 했다. “내가 본 것들이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야?” 시즌 개막을 앞두고 중위권으로 분류됐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판(예상) 뒤엎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어?” 선수들이 긍정적 자극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요즘 수원 선수들은 “타 팀 동료와 통화했는데, 여기(수원) 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종종 서 감독에게 건넨다. 약속을 지킨 셈이다. 지난해 지휘봉을 잡으면서 밝힌 “수원을 오고 싶은 팀으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대로다.
● 재미있는 축구를 하기까지
그러나 선수들을 마냥 풀어준 것은 아니다. ‘뻥 축구’라는 오명 속에 수원이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기까진 엄청난 노력이 뒷받침됐다. 수원은 혹독한 훈련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저 ‘뺑뺑이’를 돌린 게 아니었다. 목표한 체질개선을 위해서였다.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서 감독은 선수들에게 지난해 기준 ▲활동량 ▲지구력 ▲패스 성공 ▲슛 정확도 등 팀 데이터를 공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4개 구단 중 대부분 10위권 밖이었다. 알차고 재미있는 축구를 위해 올 시즌 각 부문 3위권 진입에 초점을 맞췄고, 결국 이뤄냈다. “최근 데이터를 확인했더니 1∼3위를 찍었다. 우리가 지고 있을 때, 밀릴 때면 볼을 길게 내지르고 상대 문전에서 만들고픈 유혹을 받는다. 그런데 꾹 참았다. 우린 올해, 내년을 보는 팀이 아니라 3년 뒤, 5년 뒤를 바라보니까.” 가치 있는 2등이 된 수원은 그렇게 먼 미래를 그리고 있다.
수원은 재미있는 축구를 했는데, 정작 서 감독은 ‘재미없는 사람’이란 오해를 받는다. 실제로 그는 술, 담배를 못한다. 대신 그 시간에 생각하고 고민한다. 경기도 판교 자택에서 클럽하우스가 있는 화성으로 출퇴근하는 20분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색 타임’이다. 이선희의 음반을 틀어놓고, 이루마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훈련을 구상하고 선수 활용을 연구한다. 경기에 패해 화가 나도, 경기에 이겨 기분 좋아도 궁리하고, 또 궁리한다. 팀 미팅에서 활용하는 영상자료도 그가 직접 지목한 장면들이다.
“작년까지는 술 마시고 잊고 싶을 때가 많았다. 그러다 생각을 바꿨다.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없었다. 술 마시고 잊는 건 내게는 회피였다. 차라리 멀쩡한 정신으로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 나는 아직 ‘아이’ 지도자
서 감독은 스스로를 ‘아이 지도자’라고 했다. 걸음마 수준인 ‘아기’는 벗어났어도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고 했다. 지도자 입문을 앞뒀을 때 수원에서 사제의 연을 맺은 김호 감독은 이렇게 조언해줬다. “(서)정원아, 좋은 감독이 되려면 우선 많이 져봐야 한다.” 그 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느낀다. “물론 모든 경기들을 죄다 이기고 싶다. 그런데 승률이 50%도 안 된다(37경기 18승). 질 때마다 괴롭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다. 미칠 정도로 답답하다. 그럼에도 자신의 잠재력을 끌어낸 우리 선수들처럼 나도 껍질을 깨나가고 있다. 좀더 기다려주면 훨씬 아름다운 수원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