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현진(LA 다저스), 강정호(피츠버그)처럼 한국 프로야구를 거쳐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선수가 나오고 있지만 2000년대 초만 해도 메이저리그는 한국 선수들이 꿈꾸기 힘든 무대였다.
그런데 당시 한국을 찾은 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는 미국에 데려가고 싶은 선수로 정수근(당시 두산·은퇴)을 꼽았다. 그가 밝힌 이유는 “딱∼ 하고 공이 방망이에 맞는 순간 이미 공이 떨어질 위치에 가 있더라”라는 것이다.
올해 프로야구에도 이 같은 ‘신기(神技)’를 보여 주는 선수가 있다. 삼성 중견수 박해민(25)이다.
‘박해민 슈퍼캐치’라고 검색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 진기명기에 나올 만한 호수비가 줄줄이 나온다. 자기 팀 선수들은 “와우(Wow)”라고 외치겠지만, 상대팀 선수들은 “오 마이 갓(Oh, my god)”을 내뱉을 만한 수비다. 지난달 26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7회 김민성의 타구를 펜스에 부딪치며 잡아내는 장면이나, 4월 30일 LG와의 경기에서 정의윤의 홈런성 타구를 낚아채는 장면이 대표적이다. 이런 수비는 경기의 흐름을 바꿀 뿐 아니라 팀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관중의 함성으로 가득 찬 야구장에서 박해민은 어떻게 소리로 타구의 거리와 방향을 판단할까. 그는 “설명하긴 어렵지만 타구 음을 들으면 느낌이 온다. 중견수이기 때문에 투수가 던지는 공의 위치와 타자의 스윙 궤적을 볼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현역 시절 중견수로 이름을 날렸던 이순철 SBS스포츠 해설위원은 “스피드와 위치 선정, 타구 판단 능력의 3박자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수비로만 보자면 단연 한국 프로야구 최고”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박해민이 타고난 천재는 아니다. 오히려 그는 ‘실패의 아이콘’에 가까웠다. 신일고를 졸업한 2008년 그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받는 데 실패했다. 한양대를 졸업한 2012년 드래프트에서도 모든 구단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랬던 그가 2년 만에 최강 삼성의 주전 중견수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특기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박해민은 “아무리 봐도 내가 1군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수비밖에 없었다. 선천적인 재능이 중요한 타격과 달리 수비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 외야 펑고 하나를 받을 때도 절실하게 매달렸다. 연습 때 했던 노력이 실제 경기에서 한두 번 호수비로 이어지면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했다.
어느덧 그는 삼성 라인업에서 빠져서는 안 될 선수로 성장했다. 자주 경기에 나가다 보니 방망이 실력도 부쩍 늘어 9일 현재 타율 0.301(193타수 58안타)을 기록 중이다. 빠른 발을 이용한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로 3루타는 10개 구단 모든 선수를 통틀어 1위(4개), 도루는 2위(21개)를 기록 중이다.
많은 청춘이 힘들다고 말하는 요즘 박해민이 던져 주는 메시지는 큰 울림이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하라. 이왕 하려거든 열심히 하라.’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이헌재 기자의 히트&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광화문에서
구독
-

정용관 칼럼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이헌재 기자의 히트&런]넥센 ‘떡잎’들은 빨리 자란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06/18/7192939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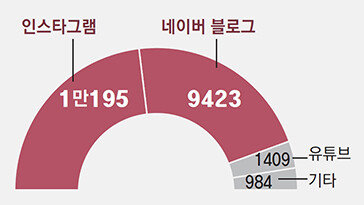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