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야구는 돈과 성적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낮다. 동원되는 선수가 많고, 경기가 매일 있고, 승패를 가를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가난한 팀이 부자 팀을 꺾는 경우가 빈번하면서, 대체로 리그가 경쟁적 균형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데 국내 프로야구는 ‘재계 1위’인 삼성이 휩쓸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4년 연속 통합 우승(정규시즌·한국시리즈 동시 우승)을 차지했고, 이변이 없는 한 올해도 왕좌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삼성의 재력이 우승을 부른 것일까.
비밀은 ‘시스템’에 있다. 야구는 수많은 사람이 개입한다. 선수도, 코칭스태프도, 프런트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 이 역할의 적절한 분배, 그리고 상호 관계가 시스템이다. 삼성은 이 구획 정리와 소통이 잘 돼 있다.
선수 발굴과 육성만 봐도 시스템의 위력을 알 수 있다. 삼성은 신인 구자욱이 뛸 자리가 없자 곧바로 군대(상무)에 보냈다. 병역을 마친 올해 스물두 살 젊은 유망주는 채태인 박한이 등의 선배들을 위협하는 슈퍼스타로 자라고 있다. 진갑용이 시즌 중반 은퇴했지만 이지영 이흥련 등 대체 자원이 보란 듯이 등장했다. 몇 년 뒤를 내다보고 준비했던 것이다. 삼성 류중일 감독이 “삼성은 이승엽이 없어도, 윤성환이 없어도 잘 돌아가는 팀”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유다. 이외에 전력 분석, 스카우트, 트레이닝 등 전반에 걸쳐 시스템이 가동된다.
한두 번 우승이 아니라 4∼5년 장기 집권이다. 다른 팀들이 아직 이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독주가 가능했다. 대부분의 구단이 감독 한 명의 리더십에 명운을 걸고 있다. 그런데 현대 야구는 감독 혼자 모든 걸 결정할 만큼 단순하지 않다. 감독 역시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선동열 전 감독이 삼성 시절에는 우승 감독으로 찬양받았지만 KIA로 이적해 추락한 것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프로야구에서 연속 우승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한다. 하지만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독주를 경계한다. SK가 올 초 시스템 야구를 선언한 것처럼, 프로야구 전체가 시스템 야구로의 전환이 거셀 것 같다.
윤승옥 기자 touch @donga.com
윤승옥 기자의 야구&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주애진의 적자생존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윤승옥 기자의 야구&]‘미운 오리’ 알아본 눈](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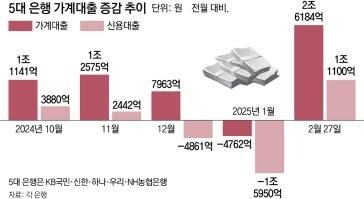


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2015-09-25 07:57:27
정도의 변명이 통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질주는 돈력질주라 본다 다만 현재의 각팀 선수년령으로 볼 때 삼성은 중년나이 지만 그외는 거의 늙은구단이고 가장 젊은구단이 NC 구단이다 내년은 아마 NC 가 우승 할 것으로 본다
2015-09-25 10:13:20
너무무식한 소리에 어안이 벙벙하다. 미국,일본 유명구단중에 가난한 구단 봤냐? 아무리 기술이 좋은 목수도 좋은 재목( 나무) 이 없으면 솜씨를 발휘할수 없다. 프로는 돈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낫놓고 기억자도 모르는자가 야구를 논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