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햇병아리 기자 시절인 1990년대 초 일이다. 프로야구단에 매니저란 직책이 있었다. 프런트와 그라운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직원. 일본에서 잘못 건너온 영어 표현이었다. 감독은 이 매니저를 주전자 당번쯤으로 여겨 온갖 심부름을 시켰다. 감독은 자신보다 젊은 단장이라면 부하 직원 다루듯이 하기도 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선 감독이 바로 매니저이고, 단장은 그 위인 제너럴 매니저인데 말이다. 프런트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때였다.
▷그래도 당시 스포츠 기자들은 꿈이 있었다. 스포츠 시장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20년쯤 지나면 창대해져 있으리란 희망. 덩달아 스포츠 전문기자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란 기대였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스포츠 시장이 양적으로 급성장한 것은 분명하다. 정상급 선수는 자유계약선수 자격만 얻으면 100억 원에 육박하는 다년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도 ‘제리 맥과이어’ 같은 에이전트가 탄생했다. 하지만 구단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졌다. 최고 인기 스포츠라는 야구단은 한 해에 많게는 200억 원에서 적게는 50억 원 정도의 적자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이 실험적인 혁신안을 내놓았다. 독립법인인 야구단과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스포츠 팀을 제일기획에 한데 모았다. 승패만 쫓기보다는 수익 창출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경영 논리로 시너지 효과는 긍정적이다. 당장 매출이 증가되는 제일기획에 대한 주식시장의 평가도 좋았다. 하지만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스포츠 시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흑자 구단 탄생을 기대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수익 창출 부담이 시장 개척보다는 자칫 긴축 재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삼성이 넥센은 아니라는 데 있다. 삼성은 한국 스포츠를 맨 앞에서 이끌어온 ‘빅 마켓’이다. 삼성의 실험은 한국 스포츠 전체의 명운이 걸린 일일 수 있다. 삼성이 ‘스몰 마켓’ 넥센을 따라잡으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따라서 삼성의 최우선 과제는 여전히 우승이고, 감동이고, 스토리다. 팬이 있어야 구단이 있다. 경영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넥센 이장석 대표처럼 프런트와 그라운드를 아우를 수 있는 국가대표급 ‘매니저’를 삼성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을 때가 온 것 같다.
장환수 기자 zangpabo@donga.com
장환수의 스포츠 뒤집기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임용한의 전쟁사
구독
-

특파원 칼럼
구독
-

유상건의 라커룸 안과 밖
구독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1개
-
- 화나요
- 0개
![[장환수의 스포츠 뒤집기]삼성의 변신은 무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5/12/23/75530213.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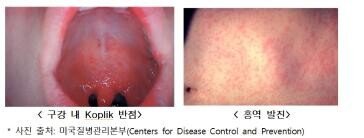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