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귀화 거부한 교포3세 유도 대표… 부친이 부담 안주려 조용히 리우行
충격패 본 뒤 고개 떨군 채 日 귀국


▼ “日귀화는 지는 것”이라 했던 안창림… 4년뒤 도쿄올림픽서 금빛 꿈 재도전 ▼
올림픽 무대에 서기 위해 아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잘 알기에 안 씨의 마음은 더 아팠다.
아들은 고교 때부터 교토를 떠나 기숙사 생활을 했다. 집에는 1년에 2, 3차례 들르는 게 전부였다. 접골원을 운영하는 안 씨는 아들이 집에 오면 정성껏 마사지를 해 줬다. 아들은 트레이너나 물리치료사보다 아버지에게 몸을 맡기는 게 좋았다. 초등학교 때 유도를 시작한 아들이 일본의 유도 명문 쓰쿠바대에 입학했을 때 안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귀화를 하는 게 어떻겠니. 그러면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을 텐데….”
강원도 출신으로 도쿄로 유학을 온 할아버지의 후손인 아들이 ‘재일동포’라는 꼬리표 때문에 국제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한 말이었다. 정작 안 씨는 갖은 차별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평생을 한국 국적으로 살았다. 아들이 귀화를 하면 동포 사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은 좀 더 편한 길을 택하길 바랐다.
이날 경기장을 빠져나오다 우연히 재일본대한체육회 최상영 회장 일행과 마주친 안 씨는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만 말했다. 허탈하긴 최 회장 일행도 마찬가지였다. 재일동포 2세로 1969년 한국 수영 국가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최 회장은 안창림의 한국행에 힘을 실어 줬었다. 최 회장은 매년 전국체육대회에 100명이 넘는 재일동포 선수단을 이끌고 한국을 찾고 있다. 안창림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재일동포 선수단의 일원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다.
최 회장은 “재일동포가 3, 4세대로 이어지면서 민족관과 국가관이 많이 흐려지고 있다. 안창림은 젊은 재일동포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4년 뒤에는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일본의 한복판에서 오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림은 40년 만에 재일동포로서 올림픽 메달에 도전했다. 비록 이번엔 실패했지만 그의 꿈은 4년 뒤로 미뤄졌을 뿐이다.
리우데자네이루=이헌재 uni@donga.com / 이승건 기자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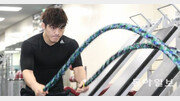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02416.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