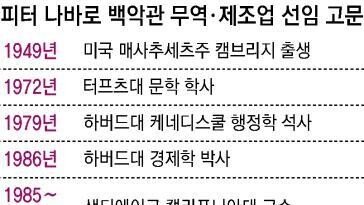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의 현장을 찾은 전 세계 취재진이 몰려드는 MPC(메인 프레스센터)에는 항상 인파가 가득합니다. 이곳을 거쳐야만 각 경기장으로 향하는 셔틀버스에 탑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층빌딩인 MPC 내부의 작업실은 늘 자리가 넘쳐났습니다. 지구촌 5000여명의 취재진이 각자 계획에 따라 어디론가 구석구석의 현장으로 떠나기에 비어있는 책상과 의자가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모이는 이른 아침과 숙소(미디어 빌리지)로 돌아가려는 늦은 밤이 돼야 절반 정도의 공간이 가까스로 찰 정도였죠.
대회가 종착역에 다다른 지금의 풍경은 중반까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빈 공간이 갑자기 크게 줄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노트북을 열고 작업하는 기자들로 붐빕니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런 광경이 연출됐을까요? 아무래도 자국 선수단의 성적과 상황 등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숙소에서 저와 함께 생활하는 포르투갈 출신 룸메이트도 대회 첫 주에는 바빠서 서로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정오가 다 돼서야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더군요. “포르투갈의 올림픽 성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니야. 대회 초반에는 우리 선수단의 경기를 점검하고, 브라질을 소개하는 주요 관광지 등을 돌아다니느라 좀 바빴는데 이제 일이 많지 않아. 하루에 르포 기사 1개 정도를 시간 맞춰 보내면 끝나.”
대한민국 선수단이 예상보다 메달 레이스에서 주춤한 상황입니다. 유력 종목들이 일찌감치 짐을 싸면서 한국 기자들도 ‘일감’을 찾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고민 끝에 찾아가도 빈 손. 이곳저곳에서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하느냐”는 푸념이 들려옵니다. 선수단이 승승장구해 일거리가 넘치고 바쁘면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은 답답하진 않거든요. 브라질 한량이 된 포르투갈 룸메이트가 그리 부럽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곳은 브라질-온두라스의 남자축구 4강전이 펼쳐지고 있는 마라카낭 스타디움 취재석입니다. 탁 트인 초록 그라운드와 시원한 골 폭풍을 보니 꽉 막혔던 머릿속이 조금 맑아진 기분이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기왕이면 이 시간에 우리 선수들을 찾았어야 했는데, 시상식의 애국가를 들어야 하는데….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밤새도록 기사를 써도 좋으니 우리 태극전사·낭자들이 끝까지 분전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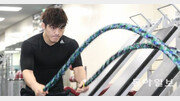

![[오늘과 내일/김승련]표와 박수만 좇는 ‘후진 정치’](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66898.1.thumb.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