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2016 리우올림픽]오혜리, 태권도 女 67kg급 금메달

“이제 2인자라는 소리는 안 듣겠죠?”
오혜리(28·춘천시청)는 20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태권도 여자 67kg급에서 금메달을 딴 뒤 2인자 이미지에서 벗어난 것을 무엇보다 기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발 뻗고 푹 잘 수 있을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리우로 떠나기 전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누구에게 가장 미안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 이번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던 오혜리다.
오혜리에게는 그동안 ‘2인자’, ‘국내용’이라는 꼬리표가 줄기차게 따라다녔다. 오혜리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년 선배 황경선에게 밀려 태극마크를 달지 못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보름가량 앞두고 허벅지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올림픽 출전의 꿈을 접어야 했다. 당시 오혜리는 24세. 4년 뒤 리우 올림픽을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은 나이였다.

리우 올림픽 금메달로 그는 ‘국내용 선수’라는 꼬리표도 떼어냈다. 오혜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친구 따라 동네 태권도장을 갔다가 태권도와 인연을 맺었다. 씨름 선수였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또래보다 키가 컸던 오혜리(180cm)는 금방 태권도에 소질을 보였다. 중학교 때부터는 취미가 아닌 선수로 태권도와의 인연을 이어갔다. 중3이 되면서 전국 대회에서는 빠지지 않고 입상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체육대회에 대학부와 일반부로 출전해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적수가 없었다. 하지만 메이저 국제대회에서의 우승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이 처음이었다. 2전 3기의 도전 끝에 올림픽 정상 등극으로 ‘2인자’, ‘국내용’이라는 꼬리표를 날려버린 ‘태권 여제(女帝)’ 오혜리는 서른이 되는 2년 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경기까지 계속 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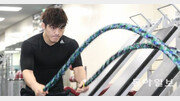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