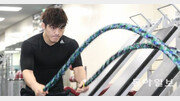■ 글 싣는 순서
(上)양궁과 그 외 종목으로 나뉘다!
(中)아시아 라이벌 中·日을 배우자!
(下)리우, 평창의 반면교사로 삼자!
미국 등 육상 선진국으로 조기유학 투자
스포츠 복권으로 유망주 성장기반 마련
한국은 큰 대회마다 말로만 ‘기초 육성’
기업후원 벗어나 자력성장시스템 구축을
‘새로운 세상(New World)’을 슬로건으로 내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17일간(6∼22일·한국시간 기준)의 열전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전 세계 206개국에서 28개 종목에 걸쳐 1만5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가운데, ‘금메달 10개 이상-종합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총 333명의 선수단(선수 204명·임원 129명)을 파견한 대한민국의 도전은 금메달 9개-종합 8위로 마무리됐다.대회 준비부터 성적까지 여러 부문에서 2% 아쉬웠다. 수많은 태극전사들과 낭자들이 피땀을 쏟아내며 최선을 다했지만, 대회 초반부터 유력한 금메달 후보들이 무너지면서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었다. 그나마 어렵게 얻은 메달들도 일부 특정종목에 편중돼 한계와 안타까움을 더했다. 또 지구 남반구의 기후와 12시간의 시차 등 낯선 환경에 대한 대비도 미흡했다. 3회에 걸쳐 리우올림픽을 결산한다.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따낸 뒤 아름다운 이별을 선언했다. ‘번개’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는 육상 남자 100m, 200m, 400m 계주에서 3회 연속 올림픽 3관왕을 달성하며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임을 또 한 번 입증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다. 펠프스도, 볼트도 개인으로 출전해도 어지간한 국가들의 역대 기록을 능가하는 몹시 특수한 경우이니 말이다.
결국 동아시아권의 ‘영원한 강자’ 중국은 물론, ‘영원한 숙적’ 일본에도 종합순위에서 밀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다. 중국은 차치하고 1988년 서울대회 이후 한국이 일본보다 낮은 순위로 하계올림픽을 마친 것은 2004년 아테네대회가 유일했다. 2008년 베이징에서도, 2012년 런던에서도 일본보다는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러나 리우에서 일본의 선전은 대단했다. 한국에 빼앗긴 유도 패권을 금메달 3개(은1·동8)로 단숨에 되찾으며 종주국의 위상을 지켰고, 레슬링에선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를 얻어 순위를 크게 올렸다.

부러운 것은 특정종목에서의 ‘초강세’가 아니다. 기초종목에서 비롯된 엄청난 차이다. 달리기(육상)와 헤엄치기(수영), 격투(투기)는 인간의 원초적 종목이다. 일본은 우리를 압도했다. 수영 하기노 고스케와 리에 가네토가 각각 남자 개인혼영 400m, 여자 평영 200m에서 세계를 제패하며 자국의 메달 레이스에 힘을 실었다. 육상에서도 아라이 히루키가 남자 경보 50km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기에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선 볼트의 자메이카에 이어 2위로 골인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예선에선 세계 최정상인 자메이카보다 빠른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단거리와 장거리에서 모두 아시아 톱 레벨임을 결과로 보여줬다.
아시아 최강인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남녀 20km 경보에서 세계 정상임을 확인시켰다. 여자 해머던지기, 남자 세단뛰기 동메달도 획득했다. 육상에서 금·은·동메달을 2개씩 따냈다. 수영 역시 엄청났다. 쑨양이 남자 자유형 200m 금메달과 자유형 400m 은메달을 획득했고, 지아유슈가 남자 배영 100m에서 은메달을 보탰다. 그 외에도 동메달 3개를 따냈다. 다이빙에선 금메달 7개(은2·동1), 싱크로나이즈드에선 팀과 듀엣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메달 획득 종목이 다양했다. 특정종목이 막히면 답이 없는 우리와는 달랐다.
반면 한국은 박태환이 수영 남자 자유형 400m·200m·100m 예선에서 일찍 탈락한 데 이어 1500m는 아예 출전을 포기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올림픽 정신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또 육상 남자 100m의 김국영과 남자 멀리뛰기·세단뛰기의 김덕현, 경보의 김현섭과 박칠성 등은 출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황영조와 이봉주로 기억되는 마라톤에서도 서글픈 결과를 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가 끝날 때마다 항상 기초종목 육성이 단골손님처럼 강조돼왔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한국육상은 리우올림픽에 대비해 우수자원들을 대상으로 단기연수를 보냈지만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다. 수영 역시 특정기업의 후원이 끊기면 그나마 혜택을 받는 선수들조차 성장을 멈출 수 있다. 지난해 김덕현은 스포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을 앞두고 단기적이지만 큰 지원이 따라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좋은 지도자와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급하지 않게, 또 차분히 먼 내일을 내다보는 기초종목의 육성이 필요하다. 풀뿌리·기초종목이 강해야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리우데자네이루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