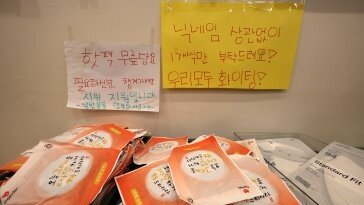상주상무 홈경기 잔디문제 당일 취소
폭염에 썩어버린 잔디보식 늑장 원인
시의 경기장 시설관리 신속대응 한계
구단으로 경기장 운영주체 전환 필요
K리그 경기가 잔디 문제로 당일 취소되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오후 4시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리기로 했던 상주상무-인천 유나이티드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6’ 30라운드 경기가 18일 오후 6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으로 미뤄졌다. 이는 현장에 파견된 한국프로축구연맹 경기감독관이 최악의 그라운드 사정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내린 긴급 조치다.
추석연휴 말미 명절특수 관중몰이를 기대했던 상주도, 극심한 교통체증을 뚫고 16일부터 1박2일의 원정 스케줄을 시작했다가 갑자기 안방으로 돌아가게 된 인천도 모두 피해자가 됐다. 상주는 프로축구연맹 차원의 징계와 별도로 인천 선수단의 원정 비용까지 물어주게 됐고, 시즌 막바지 강등권 싸움에 사활을 건 인천은 금쪽같은 시간을 고속도로에서 허비하면서 선수단 컨디션 관리에 악영향을 받았다.
모두를 울린 사태의 발단은 간단했다. 상주시민운동장의 잔디보식공사가 기한을 맞추지 못한 탓이었다. 올 여름은 유독 혹독했다. 역대급의 엄청난 폭염과 높은 습도가 한반도를 덮쳤다.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축구경기장은 사계절 잔디로 그라운드가 조성돼 있는데, 무더위에 유난히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병충해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잎이 누렇게 변색된 것은 물론 뿌리까지 썩어버리는 상황이 태반이다.

당연히 상주를 비롯한 각 구단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시즌 종료 후 잔디 교체에 나선다는 계획과는 별개로 당장이 문제였다. 수시로 그라운드를 점검하고 대형 선풍기를 틀어보는 등 애를 썼으나 역부족이었다. 죽어버린 일부 잔디를 들어내고 새로운 잔디를 보식했어도,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얼기설기 이뤄진 땜질 자국은 ‘축구 보는 재미’를 반감시키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데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경기장 장기임대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부는 최근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25년에서 50년까지 경기장 장기임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고쳤다. 그러나 실행에 옮기려면 문제점들이 즐비한 실정이다. 시설보수와 개선 등에 대한 주체를 당장 어디로 해야 할지가 고민거리다.
K리그의 한 구단 관계자는 18일 “사무국 역할의 범위가 넓지 않다. 홈구장을 홈구장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다. 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그라운드 관리도 할 수 없다. (지자체에) 잔디보식을 건의해도 답변을 받으려면 길고 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각적 대처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