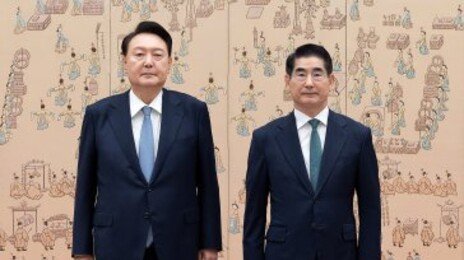2010년 6월 1일 오전 7시 25분. 남아공월드컵을 앞둔 태극전사들이 사전훈련캠프를 차린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 야크트호프 호텔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최종엔트리(23명)에 탈락한 선수 4명을 태우고 독일 뮌헨 국제공항으로 떠날 차량이었다.
10여분이 흐르고, 로비로 나온 이들은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여기에 구자철(29·아우크스부르크)도 있었다. 전날 밤 허정무 감독으로부터 탈락 통보를 받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어도 가슴은 찢어졌다.
그 순간은 오랜 시간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됐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버티며 뛰었다. 2011카타르아시안컵에서 득점왕(5골)에 올랐고 2012런던올림픽 동메달의 영광을 일궜다. 2014브라질월드컵에서도 골 맛(알제리전)을 봤다.
다시 시간이 흘렀다. 신태용(48) 감독이 이끄는 국가대표팀도 오스트리아에 왔다. 장소는 레오강으로 바뀌었다. 구자철은 최종엔트리에 승선했다. 그런데 마음은 편치 않다. 트레이드마크인 밝은 미소가 사라졌다. 그저 진지함만 남았다.
무릎 부상을 입은 지난 시즌 막판, 구단 협조로 조기 귀국해 치료와 재활로 몸을 만든 그는 아직 부족함을 느낀다. 1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가전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했으나 아쉬움이 짙었다. 활동폭도 좁고, 움직임도 둔탁했다.

그러나 구자철의 가치는 충분하다. 섀도 스트라이커~측면 공격수~수비형 미드필더 등 다재다능하다. 정상 컨디션만 찾으면 대표팀의 가용 카드는 한층 풍성해진다.
여기에 베테랑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청용(30·크리스털 팰리스), 이근호(33·강원FC)등 월드컵을 경험한 고참들이 이탈한 상태에서 구자철은 ‘캡틴’ 기성용(29·스완지시티)과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레오강 슈타인베르크 슈타디온에서 체력훈련이 진행됐을 때 그는 턱밑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고 “서로 끌어주자. 전부 함께 한다”고 모두를 독려했다. 낙오자까지 챙기려는 자세는 좋은 리더의 덕목이다.
솔직히 어깨가 무겁다. 월드컵의 중압감에 책임감도 크다. 잔뜩 들뜬 후배들을 향해 따끔한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다. 스스로 각오도 다르다. A매치 66경기(19골), 주요 메이저대회에서 득점포를 가동했던 구자철은 “긴장과 설렘을 적절히 조절하고 있다. 브라질월드컵에서의 아쉬움을 떨쳐내고 싶다”고 말했다. 8년 전 오스트리아에서 느낀 참담함, 괴로웠던 4년 전 브라질의 악몽을 딛고 일어서려는 구자철의 생애 두 번째 월드컵은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레오강(오스트리아) |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