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골퍼]올해부터 허용된 ‘깃대 퍼팅’

“이제 깃대를 뽑지 않고 퍼팅을 해도 되는 거죠?”
수도권의 한 골프장 캐디인 A 씨(54)가 요즘 주말 골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과거에는 그린 위에서 깃대를 꽂은 상태로 퍼팅을 한 뒤 공이 깃대에 맞으면 2벌타를 받았지만 이번 시즌부터 룰이 개정돼 골퍼가 원하면 깃대를 뽑지 않고 퍼팅을 할 수 있다. A 씨는 “많은 주말 골퍼의 고민이 퍼팅 능력 향상이다. 이 때문에 새 방식이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깃대 퍼팅’(깃대를 꽂은 채로 하는 퍼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전했다.
그린 위로 우뚝 솟은 깃대는 쇼트게임의 승리를 부르는 ‘특급 도우미’가 될 수 있을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신인상 포인트 1위를 질주 중인 조아연(19)은 깃대가 내리막 퍼팅 등에서 ‘방어막’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공을 조금 세게 쳐도 깃대가 막아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긴다. 실제로 경기 중에 다소 센 퍼팅이 깃대를 맞고 홀 안으로 떨어진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거리 퍼팅에서 공을 강하게 칠 때는 깃대 퍼팅이 효율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러피안투어에서 활약 중인 에도아르도 몰리나리(38·이탈리아)는 “강한 퍼팅을 할 때는 깃대를 꽂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월 깃대 퍼팅 실험을 했다. 우선 깃대를 꽂았을 때와 뽑았을 때로 나눈 뒤 퍼팅 강도를 강(공이 약간 공중으로 튀어오를 정도), 중(공이 홀 뒷벽을 때릴 정도), 약(공이 홀 중앙에 떨어질 정도)으로 나눠 각각의 조건에서 100번씩 퍼팅을 했다. 실험 결과 홀 중앙으로 강하게 퍼팅을 했을 때 깃대가 있으면 100% 홀인이 됐다. 반면 깃대가 없으면 성공률이 81%로 떨어졌다. 먼 거리에서 강하게 퍼팅을 할 때 깃대의 완충 효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깃대 퍼팅은 플레이 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이다. 한국프로골프(KPGA)투어에서 활약 중인 허인회(32)는 “깃대를 뽑았다가 다시 꽂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경기 리듬도 끊어질 수 있지만 깃대를 꽂고 퍼팅을 하면 플레이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 깃대를 뽑으러 갈 때 (캐디 등이) 상대 퍼팅 라인을 밟는 문제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강하게 치는 장거리 퍼팅과 달리 짧은 퍼팅에서는 깃대 퍼팅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주립대 골프팀과 실험을 했다. 약 1.4m 거리에서 깃대를 꽂았을 때와 뽑았을 때 60번씩 퍼팅한 결과 깃대가 있을 때 공이 깃대 중앙을 맞히지 못하면 홀인 성공률이 45%에 불과했다. 반면 깃대를 뽑고 퍼팅했을 때는 성공률이 90%였다. 김재열 SBS 해설위원은 “짧은 거리에서 힘 조절에 실패해 강하게 치는 동시에 깃대 중앙을 맞히지 못하면 공이 깃대 옆을 맞고 튀면서 홀 옆으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기상 상황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깃대가 휘면서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좁게 만든다. 이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깃대를 뽑고 퍼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정윤철 기자 trigger@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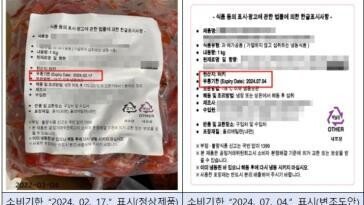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