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메달 간절했던 女에페 4인방
강영미 “세계1위 도전 열정 살아나”
최인정 “돌봐준 할머니께 바칠것”
송세라 “비싼 장비 마련 엄마에 보답”

“힘들었는지 저한테 묻더라고요. ‘병 걸리면서까지 올림픽 해야 하나요?’라고….” 펜싱 여자 에페 국가대표 강영미(36)의 소속팀 지도자인 박광현 광주 서구청 감독이 강영미의 도쿄 올림픽 은메달 획득 소식을 들은 뒤 28일 꺼낸 말이다.
강영미는 지난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그랑프리에 참가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박 감독은 “(강)영미는 귀국하자마자 몸이 안 좋은 걸 느껴서 남편과도 각방을 쓰는 등 신경을 많이 썼다”며 “그런데도 코로나19에 걸리자 많이 힘들어했다”고 밝혔다.
그런 강영미에게 이번 올림픽 은메달은 너무도 값진 메달이었다. 강영미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은퇴와 출산 계획도 미뤘다. 그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다시 열정이 살아났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펜싱을) 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결승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최인정(31·계룡시청)도 메달이 간절했다. 최인정의 소원은 올림픽 후 고향 충남 금산에 돌아가 80대인 할머니의 목에 메달을 걸어 드리는 것이었다. 최인정은 “초등학생 때까지 부모님이 바빠서 할머니 손에 컸다. 펜싱 선수가 된 이후에는 좋은 재료를 넣은 약을 만드시거나 홍삼즙 등을 사서 늘 보내주셨다”고 말했다.
‘막내’ 이혜인(26·강원도청)은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 2년 전 발생한 손목 삼각섬유연골 부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도쿄 올림픽을 맞이했다. 이혜인은 “처음 다쳤을 때는 칼을 들기만 해도 손이 너무 아팠다”며 “어느 정도의 통증은 안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훈련 도중 큰 부상으로 펜싱 선수 생활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이승림 씨를 생각하며 결승 끝까지 칼자루를 놓지 않았다.
여자 에페 국가대표팀은 28일 은메달을 목에 걸고 귀국했다. 최인정은 “올림픽 준비를 시작할 때 ‘월계관을 쓰자’는 마음으로 동료들과 맞춘 네 개의 금색 ‘월계관 반지’를 끼고 있다가 다음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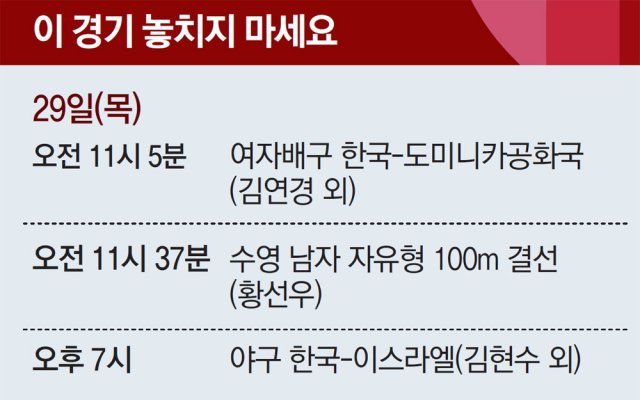
2020 도쿄올림픽 >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