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단 첫 통합우승 이끈 박경수
LG서 10년, 만년 유망주 꼬리표… 막내구단 이적 첫해 22홈런 폭발
수비력도 갖춰 최고 2루수 거듭나… 은퇴 그날까지 목표 위해 더 정진

“시즌이 끝났으니까 휴가인 건데…. 정신없었죠(웃음).”
1일 한국시리즈(KS) 우승 인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를 찾은 KT 베테랑 박경수(37)는 시즌이 끝난 후 근황을 짧게 요약해 말했다. 프로야구 막내 구단 KT의 창단 첫 통합우승에 혁혁한 공을 세우며 KS 최우수선수(MVP)로도 뽑힌 박경수에게 지난 2주가 하루처럼 흘렀다. 틈틈이 지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시간이 허락될 때마다 수원 KT위즈파크 트레이닝실을 찾아 재활에도 집중해야 했기 때문이다. 재활은 지난달 17일 KS 3차전에서 수비 도중 오른쪽 종아리 부상을 당한 여파다. 그는 “부상당한 뒤 다음 날 4차전을 앞두고 아쉬움에 2시간도 못 잤다.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 이틀 전까지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이제는 목발 없이 걸을 만하다”며 웃었다.
2003년 LG 1차 지명으로 프로에 데뷔해 지난해 처음 포스트시즌 무대에 섰던 박경수는 올해 KT의 우승과 함께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어릴 때 KS 같은 큰 무대에서 뛰는 게 소원이었다. 그런데 그 무대에서 MVP까지 했으니 지금도 꿈만 같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지금껏 최선을 다하다 보니 영광을 안게 된 것 같다.” 우승 순간을 떠올리는 박경수의 눈빛이 유난히 빛났다.
2015년 KT의 1군 입성과 함께 자유계약선수(FA)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박경수는 180도 달라졌다. 그해에만 22홈런을 치며 처음으로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그는 수비력뿐 아니라 장타력까지 겸비한 리그 최고의 2루수로 거듭났다. KT 유니폼을 입고 7시즌 동안 매년 평균 16.3개의 홈런(총 114개)을 쳤다. 올해는 9홈런에 그쳤지만 삼성과의 정규시즌 1위 결정전과 KS에서 잇달아 결정적인 수비로 팀의 중심을 잡았다. 박경수는 “돌이켜보면 잠재력이 터질 만한 시기에 KT로 팀을 옮겼고 톱니바퀴처럼 여러 부분이 잘 맞아 돌아가며 승승장구했던 것 같다. 사장님과 단장님, 감독님 모두 고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기 부여를 해준다. 이러니 한발 더 안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KT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해졌다. 강백호(22) 소형준(20) 등 젊은 유망주가 많은 KT는 과거 삼성 두산처럼 ‘왕조’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박경수는 “우승을 목표로 시즌을 시작한 건 아니었다. 하다 보니 1위도 됐고 1위 결정전을 치르며 선수들의 자신감도 많이 올라오고 통합우승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KT 왕조’ 소리를 듣게끔 더 우승하고 싶다. 내 선수생활은 길어야 1, 2년 정도 남은 것 같다. 목표를 위해 더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진 촬영에 앞서 박경수는 야구공에 사인과 등번호를 적은 뒤 잠시 머뭇거리더니 뭔가를 더 썼다. ‘KT왕조!’, 네 글자였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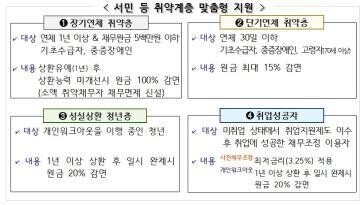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