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임 한 달이 안 된 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는 최초 타이틀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선수 생활은 짧았지만 화려했다. 1972년 고려대 최초의 1학년 4번 타자로 이름을 날렸다. 부상으로 일찍 선수 생활을 접은 뒤에는 1978년 채널A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동아방송에서 처음 마이크를 잡았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하자 MBC에서 국내 최초의 연봉제 직업 해설가가 됐다. 작고한 KBS 하일성이 구수한 입담을 자랑했다면 그는 현역 출신답게 야구 이론과 현장 취재가 곁들여진 논리적인 해설로 인기를 모았다. 이 덕분인지 1985년 말 34세의 나이에 코치도 거치지 않고 역대 최연소 프로야구 감독이 되는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청보에서 한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15승 2무 40패의 흑역사를 남긴 채 퇴장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었던 그는 1991년에는 국내 최초로 스포츠 음성 정보 서비스 업체를 창업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는 경기가 다 끝난 심야에 예쁜 목소리의 이 업체 여직원들로부터 현장 취재 이모저모를 물어보는 전화를 받는 게 즐거움이었다.
▶야구 관계자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사상 최초의 야구인 출신 허 총재는 기자와도 인연이 깊다. 주니어 시절엔 신문에 실을 그의 관전평을 정리하는 담당이었다. 사실 다른 해설가들과는 달리 그의 글은 손 볼 게 거의 없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마포의 한 아파트 바로 옆 동 이웃이었던 그는 같은 라인에 살던 배우 김혜수 씨와의 친분을 자랑하곤 했다. 괴력의 강타자답게 그의 샌드웨지는 150야드를 조준했다. 말(說)이란 게 하다 보니 또 야생 말(馬)처럼 옆으로 샜다. 각설하고 허 총재가 대단한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맡던 야구 대통령에 어떻게 올랐는지 기자는 모른다. 부산 출신에 경남고 고려대 한일은행 인맥이면 야구계에서 최고이긴 하다. 그는 대한민국 최장수 해설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속사정이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구계가 위기를 느꼈고, 변화를 바랬다는 점이다. 이게 허구연을 불러낸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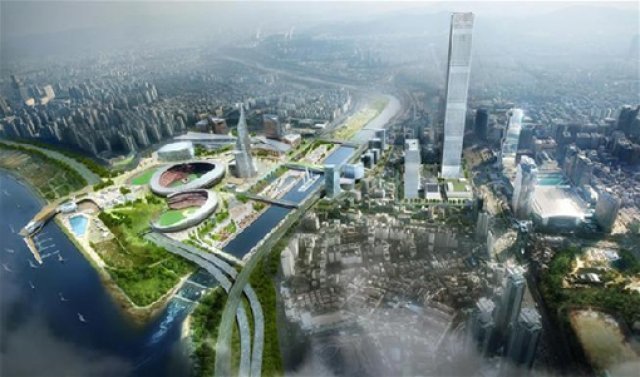

▶허 총재는 여러 별명 가운데 ‘허프라’를 가장 좋아하는 것 같다. 그의 홈페이지 타이틀은 ‘허구연의 허프라’이다. 야구 인프라를 개척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 허구연이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달아놓았다. 이를 보면 취임 이후 그가 일부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소 거칠게 가속 페달을 밟은 일들이 이해가 간다. 그러고 보니 2011년 초 KBO 야구발전실행위원회가 내놓은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 예측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 역시 당시 허구연 위원장이었다. 이 보고서는 통계학적 시계열 분석을 활용하고, 미국 일본 등 야구 선진국의 좌석 점유율과 국내 프로야구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가까운 미래에 1000만 관중 달성을 낙관했다. 그러나 이 장밋빛 보고서는 기자가 소속된 동아일보 등 일부를 제외하곤 주요 언론에서 보도조차 되지 않았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당시 8개 구단에서 팀당 133경기씩 총 532경기를 치르는 제도 하에선 전 경기가 매진돼야 1050만 명의 관중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보고서는 이후 두 번의 대반전을 겪게 된다. 첫 번째는 보고서가 예상한 시계열 분석(구단 수 증감과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제외한 통계학적 분석)을 무려 10년 이상 앞당기는 프로야구의 전성기가 바로 도래했다. 프로야구는 이듬해인 2012년 경기당 평균 관중 1만3451명의 사상 최고치를 찍게 된다. 이는 좌석 점유율로 따지면 68.1%에 이른다.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면 시장 규모와 야구장 서비스의 질에서 비교가 안 되는 미국과 일본이 평균 70% 수준이다. 양국은 홈팀이 입장 수입을 방문팀과 나눠 갖는 한국과 달라서 관중 부풀리기가 일부 있을 수 있어 이미 우리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였다. 또 좌석 점유율이 100%에 육박하는 보스턴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한신 요미우리 등이 있어 전반적인 열기에선 한국이 양국을 앞섰다는 해석도 가능했다. 이후 2013년에 NC가, 2015년에 KT가 창단하면서 대망의 10구단 체제가 완성됐다. 경기 수는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로 늘어났다. 신생구단이 생기면 평균 관중은 한동안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래도 프로야구는 양적 성장을 계속해 2017년에 840만 명(평균 1만1668명)으로 총 관중 수에서 정점을 찍었다.

장환수의 수(數)포츠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동아광장
구독
-

지금, 여기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공 크기와 승률 사이에 숨은 비밀[장환수의 수(數)포츠]](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2/05/03/113187478.3.jpg)

![‘위기→지원’ 쳇바퀴 도는 건설업이 韓경제에 주는 교훈[동아광장/송인호]](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11753.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