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 신궁’ 김진호 교수와 한자리
김, 1979년 ‘한국 양궁 신화’ 서막
“고1이던 임 봤을 때 재목이라 느껴, 해탈한 듯한 멘털… 존경심도 들어”
임 “후회 없게 도전하고 노력할 것”

“(임)시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봤다. 좋은 재목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김진호 한국체육대 교수)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던 시절이었는데 가능성을 높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교수님의 가르침 덕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임시현)
한국 양궁의 ‘원조 신궁’ 김진호 교수(63)와 ‘새로운 신궁’ 임시현(21·한국체육대 3학년)이 파리 올림픽 종료 후 한자리에 섰다. 스승과 제자는 14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기자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다.
김 교수는 제자 임시현을 통해 40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이뤘다. 임시현은 12일 막을 내린 파리 올림픽 단체전, 혼성전, 개인전에서 모두 우승하며 3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랭킹 라운드에선 세계기록(694점)도 세웠다.
임시현은 “올림픽 10연패를 달성한 여자 단체전 금메달이 가장 뜻깊었다. 운동선수로서 결과를 가져 오겠다고 말하고 경기에 임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무거운 일이라는 걸 몸소 느꼈다”며 “전훈영(30), 남수현(19) 선수와 함께 부담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땄을 때의 희열이 엄청나게 컸다”고 말했다.
임시현은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양궁 대표팀 3명의 국제대회 경험 부족을 두고 나왔던 우려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얘기했다. 그는 “대회를 앞두고 여자 대표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팀 동료들을 가장 가까이서 봐온 제 입장에선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며 “초반에 다소 힘들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응원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임)시현이는 활도 잘 쏘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아이다. 어린 나이에도 해탈한 듯한 멘털을 갖고 있다. 가끔은 존경심이 들기도 한다”며 “열린 귀를 갖고 있어 도움이 되는 말을 스펀지처럼 흡수한다. 오랫동안 좋은 선수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양궁의 신궁 계보를 잇게 된 임시현도 떡볶이 얘기에는 웃음을 참지 못하는 20대 대학생이었다. 그는 “한국에 돌아오면 매운 떡볶이를 제일 먼저 먹고 싶었는데 시간을 내지 못해 아직 먹지 못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파리 올림픽 사격 대표팀 총감독을 맡았던 장갑석 교수(65)는 여자 사격 25m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양지인(21)과 관련된 뒷이야기를 전했다. 장 교수는 “대회 이틀 전 연습 때 오발 사고가 있었다. 지인이가 쏜 실탄 파편이 뒤에 있던 에콰도르 선수의 배에 맞았다”며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경쟁국인 독일, 프랑스, 헝가리 선수들이 강하게 항의했다. 그런데 정작 에콰도르 선수단이 ‘문제없다’며 우리 편을 들어줬다. 지인이가 그런 일을 겪고도 금메달을 따냈다”고 했다. 양지인은 임시현과 한국체대 22학번 입학 동기다.
2024 파리올림픽 >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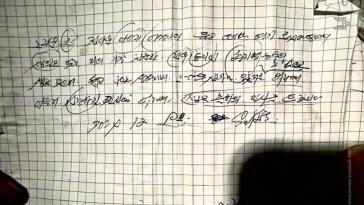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