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를 영화로 읊다] <7> 마지막 날 해야 할 일

영화 ‘영원과 하루’에서 주인공 알렉산더는 아내와의 추억이 서린 해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을 담아 ‘꽃의 마음’ ‘이방인’ ‘너무 늦은 밤’이란 세 개의 시어를 절박하게 외친다. 시네마서비스 제공
혼란한 세상 속 불우했던 포조는 오랜 병고 끝에 마지막을 예감하고 친구가 빌려 간 책을 되찾아 온다. 서진(西晉) 부현(傅玄·217∼278)의 문집이었다. 포조는 그중 ‘구학편(龜鶴篇)’에 특히 공감해 이 시를 이어 96구에 이르는 송백편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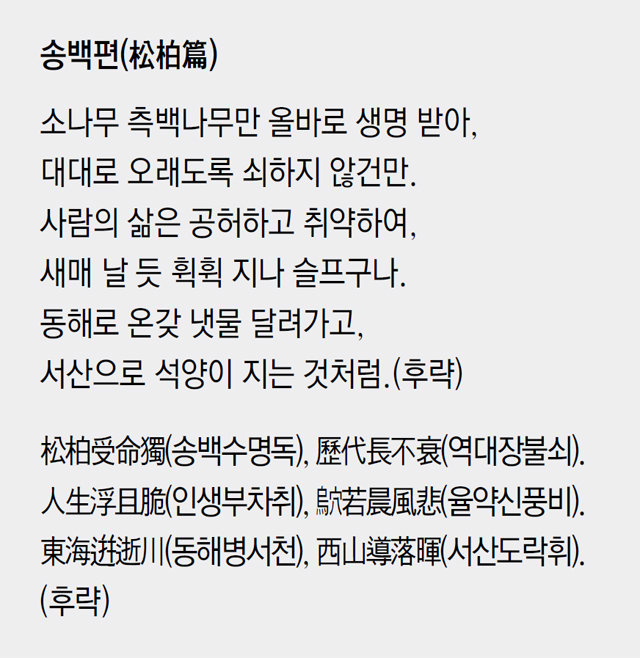
이들이 갈구하는 언어의 결핍은 시인과 주인공이 살아간 시대의 질곡과도 관련이 깊다. 걸핏하면 왕과 왕조가 바뀌던 남조의 혼란상과 그리스가 겪은 질곡의 근현대사가 이들에게 마지막 시를 쓰게 만든 것인지 모른다. 시는 그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며 이유였다.
포조는 “시간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품은 뜻은 날마다 가라앉아 가네. 인생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니, 하늘의 도는 어떤 사람에게 허락되는 것인가(年代稍推遠, 懷抱日幽淪. 人生良自劇, 天道與何人)?”(‘대호리행·代蒿里行’)라고 읊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알렉산더는 절박하게 ‘꽃의 마음’ ‘이방인’ ‘너무 늦은 밤’이란 세 개의 시어를 외친다. 그중 ‘너무 늦은 밤’이란 말은 죽음 앞에서 느끼는 회한과 성찰을 암시한다. 알렉산더가 일에만 매달려 아내를 외롭게 만든 과거를 후회한 것처럼 포조도 삶을 함께 즐기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늦었다는 말은 기회가 남아 있음을 계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모두 삶에 대한 성찰과 각성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란다. 영화에선 내일을 “영원과 하루”라고 말한다. 남은 시간도 그 영원 속의 하루하루일 것이다. 영원히 반복돼 온 끝이자 또 다른 시작으로서.
임준철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