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four)에버 육아’는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기자가 일상을 통해 접하는 한국의 보육 현실, 문제, 사회 이슈를 담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담는 것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를 기르는 맞벌이 엄마로서 겪는 일화와 느끼는 생각도 공유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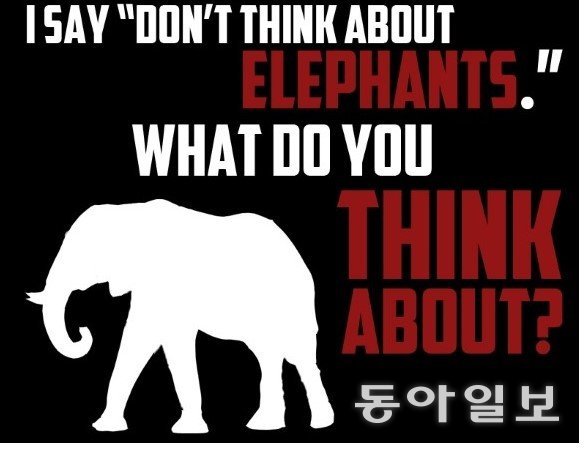
사진 출처 yes24 홈페이지
● “저출산이라는 말, 사회에 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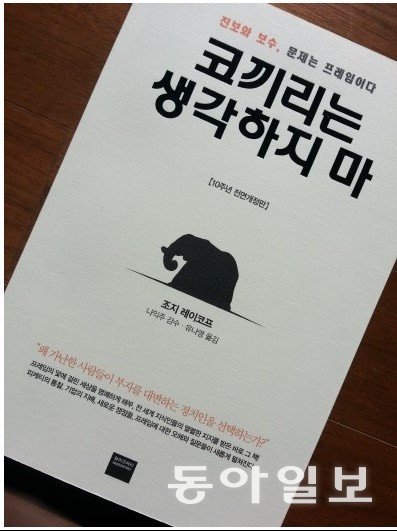
사진 출처 yes24 홈페이지
저출산이라는 말이 너무 만연해서 오히려 인구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다. “갈수록 저출산이라는 용어에 오히려 갇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전문가는 2006년부터 5년에 한 번 발표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 명명된 인구계획을 설계한 학자 중 한 명이다.
● 저출산의 홍수…무감해진 사람들
저출산이라는 시사 용어는 어느덧 한국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들을 수 있는 일상 용어가 됐다. 언제부터 통용되기 시작했을까. 포털사이트 네이버 뉴스에서 저출산을 검색하면 1992년 처음으로 ‘저출산력시대’라는 말이 등장한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저출산은 ‘1년에 한두 번 검색될까 말까’한 생소한 단어였다. 그러다 2000년대 이후 그 사용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다. 요즘 온라인에서 저출산을 검색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의 새 게시물이 검색된다. 말 그대로 저출산 콘텐츠의 홍수다.저출산 상황이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심각해졌으니 자연스러운 일이다. 1980년대 초반 80만 명대에서 지난해 24만9000명으로 40년 새 반의 반토막이 났다.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계산한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 1명 미만을 기록한 이래 계속 떨어져 지난해는 0.78명을 기록했다. OECD 선진국들은 물론 합계출산율을 발표하는 나라들을 통틀어 최저 수준이다.
EBS 캡처 화면
● ‘저출산 경고’ 반복, 되레 체념 강화
코끼리를 상상하지 말라고 하면 되레 코끼리에 대한 온갖 의심이 머릿속을 채운다. ‘코끼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왜 콕 집어 코끼리지? 혹시 사실은 진짜 코끼리인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면 오히려 현재 처한 저출산 상황이 더 강하게 인식될 수 있다. 최근 며칠간 갓 입사한 젊은 기자 후배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다. 20, 30대 초반인 이들 1990년대생 후배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무척 인상적이었다. “다들 저출산이라는데 ‘나는 꼭 결혼할 것’이라 말하는 친구가 있다.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심각하다, 심각하다, 계속 듣다 보니 과연 해결 방법이 있나 의문이다. 솔직히 ‘내가 뭘 해본들 바뀌겠느냐’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후배들에게서 이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삶이 주류’이고, ‘그것을 쉬이 바꾸기 어렵다’는 단단한 체념이 읽혔다. 어렸을 때부터 저출산이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온 탓이었다.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경각심을 고취한 말들이 되레 저출산을 보편적인 상황, 바꾸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아이러니였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한 장면. 영화 화면 캡처
● ‘저출산’을 축출하라
한국에 앞서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던 나라가 있다. 바로 이웃 나라 대만이다. 대만의 출산율은 2010년대 0.9명대로 떨어졌다. 이때 대만 정부가 취한 태도는 온 사회에 저출산 ‘적색경보’를 울리는 게 아니라 대책은 마련하되 ‘출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끄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후 대만의 출산율은 소폭이나마 반등해 다시 1명대로 돌아갔다. 반면 한국은? 1981년 86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가 절반인 43만 명대로 떨어지는 데 32년이 걸렸는데(2013년 43만6455명), 이후 전 사회적인 저출산 경보가 시작됐음에도 최근 9년간 출생아 수는 24만 명대로 다시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 저출산 속도가 오히려 더 가속화된 셈이다.
동아일보DB
물론 대만의 출산율 반등이 언어 프레임 때문만은 아니었을 테다. 저출산은 복잡다단한 문제가 얽힌 결과다. 하지만 분명 그의 말에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 스스로 저출산이란 말을 반복 재생산해가며 현실 인식을 고착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참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인구위원회’나 다른 미래지향적인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면 어떨까 싶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다. 반면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누구든 자꾸 코끼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