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의 세계: 6가지 물질이 그려내는 인류 문명의 대서사시/에드 콘웨이 지음·이종인 옮김/584쪽·2만9800원·인플루엔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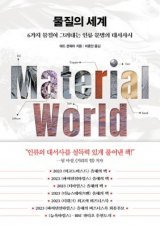
마크 쿨란스키의 ‘대구(cod)’에는 ‘세계의 역사와 지도를 바꾼 물고기의 일대기’라는 어마어마한 부제가 붙어 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관점으로도 책을 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세 유럽에서 발전한 박물학이 생물학, 지질학, 광물학은 물론이고 고고학, 인류학 등으로 심화해 간 과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꾼 힘’이나 팀 마셜의 ‘지리의 힘―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세계사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등 이런 유형의 책이 서구에서 잘 팔리는 걸 보면 말이다.
이 책도 비슷한 관점에서 모래, 소금, 철, 구리, 석유, 리튬 등 6가지 물질과 그와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인간 세계를 확장시키고 역사를 움직여 왔는지를 지구촌 곳곳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 제너럴모터스의 엔지니어 토머스 미즐리는 휘발유에 테트라에틸납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엔진 잡음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런데 납은 강력한 신경독소로, 어린아이의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에 제너럴모터스는 납을 대체할 방안을 찾는 대신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이름을 고쳐 썼다. 테트라에틸납을 에틸로 바꾼 것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