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근무 속 일상화된 성폭력… 한편엔 환경 파괴로 오리 떼죽음
나는 피해자일까 가해자일까… 살기 위해 버틴 광산에서의 2년
장엄한 풍광 속 복잡한 내면 그려
◇오리들/케이트 비턴 지음·김희진 옮김/436쪽·2만9800원·김영사

저자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 나은 인생을 쟁취하기 위해 오일샌드로 향한다. 김영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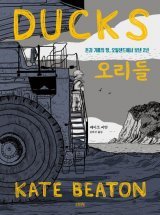
“좋은 일자리, 좋은 돈벌이, 더 나은 인생을 위해 찾아갈 곳은 캐나다 앨버타주 북부의 ‘오일샌드(원유 성분이 함유된 모래)’ 광산이다.”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저자는 고향인 캐나다 동부의 해변마을 케이프브레턴을 떠나려고 한다. 목표는 단 하나. 돈을 벌어 대학 학자금 대출을 단번에 갚는 것이다. 신간은 캐나다 유명 만화가인 저자가 명성을 얻기 전인 2005년 오일샌드 광산에서 보낸 2년을 그린 그래픽 노블(만화형 소설)이다. 야생동물과 오로라 등 앨버타의 장엄한 자연을 담아낸 그림과, 광산에서 만난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 글이 눈길을 끈다.
캐나다 최대 오일샌드 채굴업체 ‘싱크루드’의 공구 담당 직원이 된 저자의 하드코어 ‘미생(未生)’이 펼쳐진다. 그가 맡은 업무는 현장 노동자에게 필요한 장비를 대여해주는 간단한 일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열악했다. 살가죽을 벗겨내는 듯한 영하 40도 이하의 강추위를 매일 견뎌야 했고, 채굴 과정에서 오염된 공기 탓에 기침과 가래가 끊이지 않았다. 햇빛이 들지 않는 광산에선 아무리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울함을 이길 수 없었다.
캐나다 앨버타주 북부의 오일샌드 광산의 노동자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 있는 모습을 저자가 만화로 표현했다. 신간은 저자가 돈을 벌기 위해 광산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겪은 성폭력과 환경 문제 등을 담고 있다. 김영사 제공
결국 저자는 잠시 광산을 떠난다. 은퇴자들의 부유한 도시인 빅토리아섬의 해양박물관에서 일한다. 이곳에선 광산 노동자들의 성희롱 대신 동료로서 존중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낮은 급여. 박물관은 주 최대 노동시간이 21시간이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도 학자금 대출을 갚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저자는 앨버타 광산으로 돌아온다.
책의 묘미는 저자가 온전한 피해자로만 묘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석유 채굴 작업 후 남은 오염수 웅덩이인 ‘테일링 연못’에선 수백 마리의 오리가 죽어간다. 계약직 노동자가 중장비에 깔려 숨져도 회사는 “근로 손실 재해 없이 노동시간 300만 시간을 달성했다”며 자축한다. 저자에게 학자금 대출을 갚을 돈을 준 광산회사는 인근 원주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파괴한 악덕 기업이었다. 저자는 늘 폭력을 당하는 쪽이라고 여겨온 자신이 환경을 파괴하고 원주민의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는다.
“모두 저마다의 오일샌드를 경험했다. 이것은 내가 겪은 오일샌드다.” 저자는 산전수전 겪은 오일샌드를 단순히 나쁜 곳 혹은 좋은 곳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힘든 와중에 저자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아빠 같은’ 사람들도 그곳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오일샌드의 끔찍한 면을 알려달라”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기자보다 광산 동료들에게 더 동질감을 느끼는 것도 그래서다. 노동 소외, 성폭력, 환경 파괴 등이 점철된 오일샌드 광산은 한국의 현실과도 동떨어져 있지 않다. 책을 읽다 보면 치열한 사회생활 속에서 ‘나의 오일샌드’가 어딜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