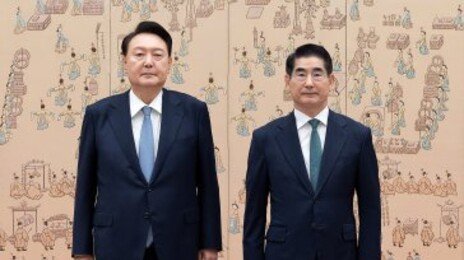“예? 빗이요? 빗은 뭐하게….”
“그냥, 머리 빗으려고.”
“아아, 머리 빗으려고….”
눈보라 몰아치던 85년 1월12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 객실과장 김성환씨(35·서울 성북구 정릉2동)의 겨울은 이렇게 황당하게 찾아왔었다. 당시 성신여대 근처 ‘해바라기’카페에 커피 설탕 등을 배달하던 아르바이트생 김씨. 배달을 시작한지 보름이 못된 이날 오전 1시에 그동안 눈인사만 했던 카페 여주인의 대학 후배 채미령씨(34·전업주부)로 부터 뜬금없는 전화가 걸려왔다. 이윽고 동이 트고 김씨가 커다란 큐빅이 박힌 황토색 빗을 사든 채 돈암동에 나타나면서 이들의 운명적 만남은 시작됐다.
추억의 장소로 가는 프린스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는 김씨.
아아, 남산. 촌스럽고도 아름다운 이름. 호텔에 입사하기 전까지 줄곧 남산 시립도서관에서 취직공부에 여념이 없던 김씨. 그를 ‘먹여 살리기’위해 채씨는 매일 저녁 남산 식물원에서, 어느덧 이름까지 줄줄 외는 식물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이다 이윽고 만난 김씨에게 그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가스와 딸기잼이 담긴 찬합을 펼쳐보이곤 했다. 6년간의 연애. 그들도 위기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채씨의 표현대로 ‘한번 되게 헤어질 뻔’한 것은 김씨가 취직 3년째되던 91년 1월. 사람 잘 믿기로 소문난 김씨가 학교 선배에게 아무생각 없이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거금 3백만원을 사기당한 것이다. 평소 ‘셈’에 밝지 못한 김씨를 걱정하던 채씨는 급기야 결별을 선언.
“마지막으로 만나자!” 김씨의 비장한 목소리에 채씨는 남산도서관 옆 ‘108계단’(정말 계단이 1백8개는 아니다) 입구에서 이틀 뒤 최후의 만남을 갖기로 했다.
약속한 1월15일. 말없이 1백여개의 계단을 끝까지 오른 김씨가 채씨 앞에 무릎을 꿇었다.
“흐흐흑…”. 김씨가 91㎏의 몸무게에서 별안간 쏟아내는 눈물. 때마침 민방위 사이렌에 소스라친 채씨는 저도 모르게 “알았어, 알았어, 안헤어질게”하며 김씨의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그후 잡지에서 ‘Love is… 1주일동안 빠지지 않고 장미꽃을 선물하는 것’이란 문구를 보고 이웃집 담밖으로 삐져나온 덩굴장미를 1주일 내내 손으로 꺾어 가시째 선물하는 정성을 바쳤다. ‘108계단’에서의 ‘번뇌’가 효력을 발했음일까, 보름 뒤 두사람은 카페 ‘남산 스카이라운지’에서 다시 만났다.
겨울 세찬 바람에 처녀마음처럼 미친듯이 흔들리는 풍향계. 그 끝으로 아스라히 인천 앞바다가 눈에 들어올 무렵 더덕과 솔잎이 들어간 계명주(鷄鳴酒) 한잔을 마시던 채씨가 불쑥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TV는 큰 거라야 되겠지?”
“으응? TV?”
“으응. TV.”
“으으응. 커도 괜찮지….”
아아, 이들은 이렇게 연결돼 장기간의 ‘지루한’ 연애에 종지부를 찍고 화촉을 밝히게 되었으니 91년 4월13일의 일이었다.
〈이승재기자〉
드라마 e장소 : 음식점 >
-

동아시론
구독
-

이문영의 다시 보는 그날
구독
-

인터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드라마 e장소/음식점]'코스별로 나눠 먹는 특별한 김밥 요리'](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