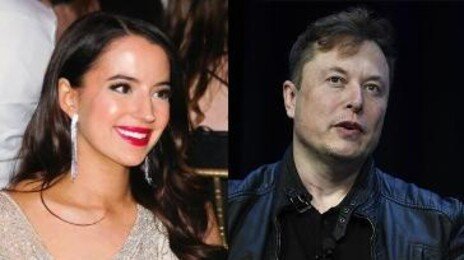그동안 정치권은 헌정사상 첫 여야간 정권교체에 적응하지 못한 채 혼돈을 겪었다. 시대적 과제인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의 조기극복과 총체적 개혁을 외면하며 표류했다. 대화와 타협보다 ‘수(數)의 승부’에 매달려 대립과 파행으로 치닫기 일쑤였다. 여소야대가 정부의 국정수행에 하나의 장애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허상을 이미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정계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 여권의 안정세력 확보노력도 얼마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의 통합은 정치적 의미에서 한계를 갖는다. 국민신당은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결과에 불복한 소수세력의 급조정당이다. 국민회의는 그런 ‘정치적 미아(迷兒)집단’을 흡수했고 국민신당은 창당 10개월만에 소멸하는 전형적 포말정당이 됐다. 우리 정당사에서 늘 그랬듯이 이번 통합에서도 이념 노선 정책의 조정 없이 이해(利害)타산이 앞섰다. 통합의 시기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이어서 ‘한나라당 흔들기’ 공작의 냄새를 풍겼다. 통합의 과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져 투명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여권은 한나라당 의원 영입을 위해 정치권 사정(司正)과 경제청문회 방송청문회를 압박카드로 쓰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나라당 특정계파를 끌어들이기 위해 청문회 시기를 조정하고 그 세력이 연루됐음직한 분야를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잘못이다. 그것은 청문회의 순수성과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할 뿐이다. 그런 청문회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약점 잡힌 의원들이 개혁의 주체로 행세한다면 누가 개혁을 따르겠는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정치안정과 동서화합을 통해 총체적 개혁을 이루려는 것이 국민신당과의 통합 이유라고 말했다. 통합이 그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여권의 의석수가 반드시 정치안정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의정사의 경험이다. 국민신당의 대표적 면면은 이번 통합이 지역화합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회의(懷疑)도 낳고 있다. 문제는 정계개편 자체나 의석수가 아니라 정치력이다. 여야대치가 첨예해질 공산이 있는 향후 정국은 여권의 정치력을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화제의 비디오 >
-

글로벌 책터뷰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화제의 비디오]분출구 못찾은 젊음 그린 「크랙시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