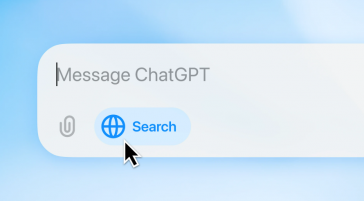선진국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이른바 교토의정서 메커니즘에 대한 운영방식을 구체화하는 일을 빨리 마무리하자는 주장을 폈다.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이 개도국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선발개도국으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있으나 2008년부터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부속서Ⅰ국가에 속하지 않는다. 작년 당사국총회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헨티나가 부속서Ⅰ국가가 아니면서도 의무부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아르헨티나가 이번 총회에서 감축목표의 수치까지 제시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한국 멕시코 등 주요 개도국에 대해 조기참여를 권유하는 등 압력을 넣고 있다.
한국은 의무부담 참여시 국내 경제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최대한 의무부담 시기를 늦추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총회에 참가하면서 다소 전향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필자는 정부대표 연설을 통해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목표를 경제성장과 연계하는 새로운 의무부담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자발적이며 비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현 단계에서 새로운 의무부담 방식이 구체화된 것도 아닌 데다가 의무부담 참여시기를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의사표시로 국제적 압력에 그리 만족스럽게 화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구체적 규제의 가시화는 이제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이번 회의에서 늦어도 2002년까지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되는 것을 볼 때 명분과 실리를 앞세워 환경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세계의 경제 무역 질서를 지배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또는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규제하겠다는 방식으로 무역시장을 조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출지향형 경제체제와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로는 당분간 에너지 소비도 증가세를 벗어나기는 힘들다고 보아야 한다.
이 모순적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국제사회의 도도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그 흐름 속에 뛰어들어 스스로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세계의 거대한 환경시장에서 잃을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바탕 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다. 그 가운데 국민 모두가 에너지 절감의 기술자가 되어 생활 속의 낭비를 줄이는 일도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김명자(환경부 장관)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중훈의 세상스크린]배우지망생때의 시련](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