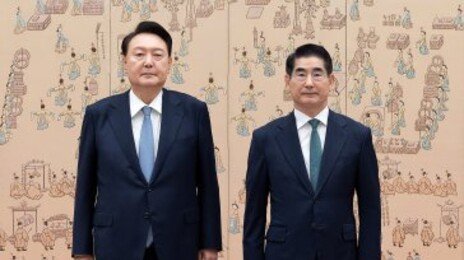▷그럼에도 일본재계의 반응은 냉정하다. 임금인상보다 고용증대를 중시하는 자세가 견고하다. 닛케이렌(日經連)은 “실적이 좋은 개별기업은 몰라도 일괄 3% 인상은 안된다”고 공언했다. 상공회의소는 “특정기업 특정업계는 임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동우회는 “임금을 일률 조정하는 춘투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고 들고 나왔다.
▷국내 노동계도 춘투에 시동을 걸었다.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13.2%, 민주노총 15.2%다.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철폐,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도 요구했다. 두 노총은 요구관철을 위해 총선에서의 ‘반개혁’ 반노조 후보 낙선운동 등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병행키로 하고 ‘5월 총파업’의 배수진까지 쳤다. 이에 대해 재계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강경노동 운동이 올해 경제의 최대불안요인이라며 정부와 여론의 견제를 유도한다.
▷1997년 말과 98년, 부분적으론 작년까지 감원선풍이 전국 노동현장을 휩쓸었다. 수년, 수십년 동안 한솥밥을 먹던 종업원들을 위로 한마디 없이 무더기로 해고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살아남은 노동자들은 ‘반토막’감봉까지 감수해야 했다. 지금 노동계의 요구수위가 높은 것은 지난날의 상실(喪失)이 워낙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노사정(勞使政) 어느 쪽이건 너무 지나치고 강경하면 결국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모두의 경험이다. 정부가 억지로 줄였어도, 아직도 100만명의 실업자가 거리에서 떨고 있고 취업자라 해도 셋 중에 하나는 임시직 일용직으로 변해버린 현실 또한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배인준 논설위원> injoon@donga.com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 >
-

광화문에서
구독
-

동아시론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충무로 반항아' 임상수 감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