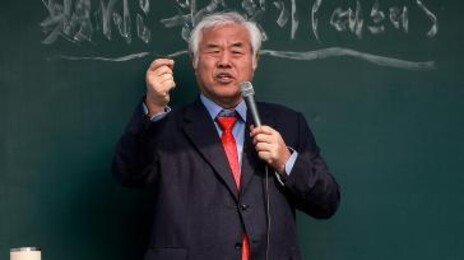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복잡한 피조물이라면,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 중에서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 후 조금씩 쌓아올려 오늘날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남산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아,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 이런 ‘바벨탑’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이 활기차게 도시생활을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활동공간은 넓고 뒤에 따라오는 부대시설은 작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 통신에서부터 시작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시설들은 작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곳에 집적시켜 놓게 된 것이다. 그 무서운 고압선까지 땅속에 묻어 보이지 않게 한다니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 원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도시는 진정으로 인간이 쌓고 있는 바벨탑이다. 사람의 신체구조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 이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일이라 할 만하다. 신은 성경 속의 바벨탑에 대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언어를 달리해 대화단절이란 무기로 응징했다. 첨단 도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궁금하다.
만일 신이 도시라는 바벨탑에 대해 대응한다면 ‘무신경’ 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18일 밤 서울 여의도 지하공동구에서 일어난 화재가 바로 이런 증거다. 우리 인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더라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이미 96년 안전진단 결과 누전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 지적받은 일도 있다. 안전불감증을 버리지 못해 맞은 일이다.
하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이처럼 다행한 일도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금요일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
만약 주중에 일어났더라면 증권과 금융에 큰 혼란이 일었을 것이고, 이것이 전세계에 전송돼 국가적인 손실은 더욱 컸을 것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복구할 시간적인 여유까지 주었다. 경고 메시지만 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4년에는 서울 혜화동의 광통신선로 화재를 통해 1차 경고가 왔다. 우리는 과거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한 바 있다. 성수대교 사고를 통해 교량의 유지보수비가 헛돈 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번 경고를 마지막으로 알고 지하시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서두를 때가 되었다. 이미 주먹구구식 관리로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 첫 단계로 국가의 중추가 땅속에 있다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현대국가의 중추신경은 통신망이다. 정보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경제 국방 등의 주요 기능이 이에 의존된다. 현대 국가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만하다. 이런 통신망을 관리하는 일은 국가안보 차원의 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동안 앞만 보고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관리하는 일은 낭비라는 생각도 했다. 마치 파리에 가서 택시를 타고 팁으로 돈을 더 내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유지보수 비용은 건설비와 함께 당연히 책정되어야 할 예산이라 생각하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떨칠 수 없는 못된 습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겸허한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면 기술개발과 설계시에 사후관리가 소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광형(한국과학기술원 교수)
황희연의 스타이야기 >
-

동아리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황희연의 스타이야기]기린을 닮은 여자, 장만옥](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