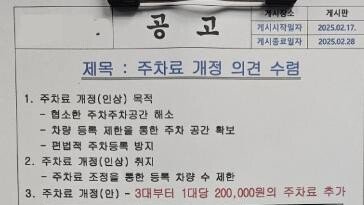선거에 있어서 선관위는 운동경기에서의 심판과 같다. 선거판에서 선관위의 역할은 공명선거를 담보하는 데 있다. 선관위의 그런 중립적 역할이 무시되고, 더욱이 마음에 안든다고 폭력까지 행사한다면 그 선거결과는 승복하기 어렵다. 4·13총선을 앞두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선거판을 보면 선관위의 ‘영(令)’이 제대로 서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이번 총선은 공천 후유증에 의한 4당의 난립으로 과거 어느 선거때보다 혼탁하고 격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선거운동기간(3월28일∼4월12일)에 채 들어서기도 전에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는 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지적한다. 지역감정선동과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돈선거 관권선거를 우려하는 소리도 높다. 후보들은 기업들을 상대로 선거자금을 울거내려고 안간힘이고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돈과 음식대접 등을 받으려고 손을 내민다.
선거판이 혼탁할수록 선관위의 활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단속요원들을 ‘심판’으로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풍조가 단속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선관위측은 이번 선거에서 그런 풍조가 만연된 이유로 첫째,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회 등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버젓이 하는 반면 원외인사나 신인의 경우 그것이 불가능하게 돼있어 ‘억울’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냥 있을 수 없게 하는 현상이 있으며 둘째,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그들은 놔두고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든다. 특히 힘있는 후보측은 “선거만 끝나면 보자”며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일선 단속요원들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단속요원도 선관위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합쳐 3000여명뿐이어서 인력도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선관위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면 공명선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도로 철저한 단속과 고발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감시의 눈’ 역시 선관위 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요건임은 물론이다.
화제의 비디오 >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김영민의 본다는 것은
구독 142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화제의 비디오]분출구 못찾은 젊음 그린 「크랙시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