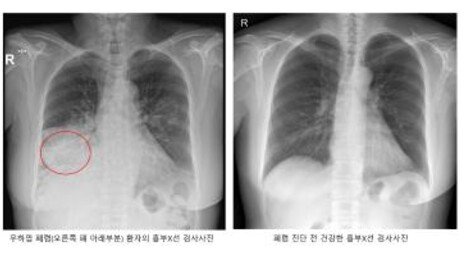퇴출기업 판정이 본격화되면서 극소수 우량기업을 뺀 거의 모든 회사에 돈줄이 말랐다. 내수경기라도 받쳐줘야 현금을 손에 쥘 텐데 매출 실적은 추석을 고비로 뚝 떨어지고 있다.
A씨가 속한 그룹도 계열사 가운데 퇴출 판정을 받는 곳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현금을 최대한 끌어모아 일단 연말을 무사히 넘기자고 다짐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의욕을 꺾는 소식만 들린다”며 한숨이다.
그는 정부가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했을 때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회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사치스러운 이슈일 뿐”이라며 “삼성 LG SK처럼 형편이 좋은 그룹에나 해당되는 문제이지 우리 같은 중견기업들은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요즘 A씨와 비슷한 심정을 털어놓는 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선을 여러 곳으로 펼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상식”이라고 말했다. ‘제2의 외환위기’라는 무시무시한 상대를 앞에 두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쪽에 힘을 분산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3년전 금융불안 조짐을 도외시한 채 경제부총리가‘세계화’에만 매달리다 IMF 구제금융으로 내몰린 뼈아픈 실패를 되풀이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A씨의 목소리를 단순히 기업개혁을 거부하는 수구의 논리로 매도해야 할까. 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기업들의 의욕도 꺾지 않는 묘안은 없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원재<경제부>parkwj@donga.com
빛나는 조연 >
-

광화문에서
구독
-

오은영의 부모마음 아이마음
구독
-

정경아의 퇴직생활백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빛나는 조연]英배우 주드 로/주연 압도하는 '2色 카리스마'](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