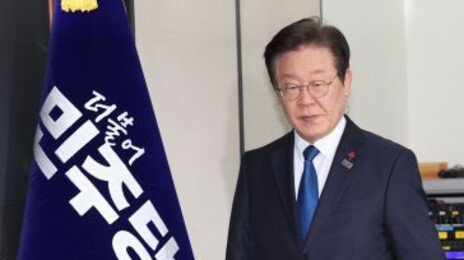오늘날에도 기록은 중요하다. 특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거 통치기록은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20세기 혼란의 와중에서 우수했던 기록문화의 전통이 ‘실종’되어 버린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록물 관리법을 제정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를 의무화한 이 법은 이같은 전통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이 법의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어 학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책 결정에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할 때 ‘발언 내용’을 적도록 한 것에서 한발 후퇴해 ‘발언 요지’로 대체해도 상관없도록 한 것이다. 학계에서는 ‘전체 발언’이 아닌 ‘요지’만 담은 회의록은 없느니만 못하다는 소리가 높다. 정확한 발언내용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는 비리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흥분하기도 했다.
정부는 기록학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도 완화해 공무원 출신도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 제정 이후 전문 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국가기록연구원측은 이 소식을 듣고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전문요원으로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은 석사학위 소지자들인데 자격조건이 완화되면 누가 전문요원을 지망하겠느냐고 항변한다. 이번 법 개정은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과거의 일을 기록하고 반성하는 것은 어찌보면 모든 문화행위의 기본이다. 학문이나 문화라는 것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진보하는 것이 아닌가. 기록문화는 작은 일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문제다.
<윤정훈기자>digana@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수룡의 부부클리닉]당신 틀에 맞추라고?](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