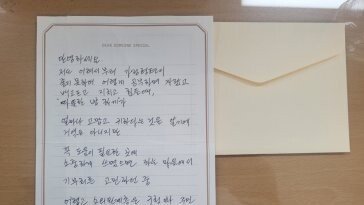당시 동아일보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구속돼 재판 받는 사람들의 기사가 매일처럼 실렸다. 사회면의 절반 이상이 그 기사로 메워진 적도 있다. 어두웠던 시기에 검찰청과 법정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김근태 노무현 설훈 김민석 이상수씨 등은 현재 민주당에 몸담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재야 인사들이 민주화를 외치다 고난을 당할 때 지면을 통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도 동아일보였다. 그들의 고난에 대해 침묵하거나 왜곡했던 방송은 지금 언론개혁을 외치고 거꾸로 동아일보는 개혁의 도마에 올랐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필자는 6월 항쟁을 불러온 박종철 사건 관련 보도로 한국기자상을 87, 88년 두 차례 수상했다. 그 시절에는 일선 기자들이 아무리 힘들게 기사를 써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신문과 방송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여건에 굴하지 않고 기사를 게재한 회사 전체가 받은 상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 1월 19일자 동아일보는 전체 12면 가운데 6개 면을 온통 박종철군 사건으로 채웠다. 이 사건 고비고비마다 동료들과 함께 편집국에서 꼬박 밤을 세우며 팔이 저려올 때까지 기사를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문은 광화문 일대에서 가판으로만 수십만부가 나갔다.
5공화국 당시엔 보도지침이라는 괴물이 있었다. 공보처 안기부 등의 의견을 집약해 시국 관련 기사의 크기를 제한하고 심지어 제목과 면까지 지정하는 보도통제 문서였다.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의 실상을 알면서도 보도하지 못할 때는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다. 보도지침을 위반하면 협박과 고문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지침의 이행 정도를 조사했던 한 재야단체는 당시 동아일보가 보도지침을 가장 많이 위반한 신문사라고 밝혔다. 관변 신문과 방송들은 보도지침보다 한 술 더 떠 독재권력에 빌붙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노력과 희생이 합쳐져 6월 항쟁이라는 강물을 이루고 마침내 민주화라는 대해(大海)에 도달했다. 6월 항쟁의 결과로 체육관 선거가 사라졌고 이러한 바탕에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탄생했다.
동아일보는 일제 총독부에 의해 기사삭제 압수 발매정지가 다반사로 이루어졌고 4차례 정간을 당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옥고를 치렀다. 창간 초기에서 중기까지의 기사들을 보면 일제강점기하에서 이런 신문을 발행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신문은 더욱 혹심한 검열 속에서 제작되다 1940년 강제폐간의 운명을 맞았다.
동아일보의 역사에도 영욕이 교차한다. 때론 부끄러운 잘못도 없지 않다. 계엄령 하에서 물에 젖은 대장을 들고 군 검열관이 북북 지운 기사를 비통한 마음으로 빼내던 시절도 있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동아일보의 보도와 논평에 대해 여러 갈래의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근래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동아일보가 이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에 기여한 엄연한 사실까지 부인하며 81년 역사를 깡그리 짓밟는 것은 공정보도도 아니고 균형 잡힌 시각도 아니다. 역사의 왜곡이다.
물론 동아일보에 대한 비판중에는 귀담아들을 내용도 많다. 그러나 범죄집단처럼 매도당할 때는 참으로 억울하다. 동아일보는 사주만의 신문이 아니다.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해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군사독재와 싸웠던 많은 기자들이 아직도 현장에서 뛰고 있다. 동아일보를 매도하는 이들은 그 어려웠던 시절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언론사도 망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망해야 할 언론사가 동아일보라고 큰소리치며 자기들만 영달하겠다는 것이 언론자유이고 민주주의인가.
사회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언론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개혁할 것이 있으면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에 의한 언론개혁은 위험하다.
민주화라는 대의를 위해 함께 고민했던 어제의 동지들이 오늘 죽고 죽이는 편으로 갈라서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는 현실은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황호택<본보 논설위원>hthwa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