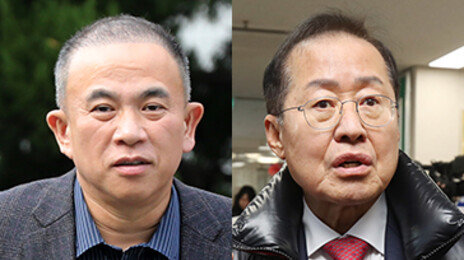여성들에게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소리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했을까. 중세 유럽의 스승 성 히에로니무스(340~419)다. 로마 귀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로 딸들을 세뇌시키게 한 거다.
고대 그리스 정치가 데모스테네스도 누대를 걸쳐 씹힐 발언을 했다.
“우리들은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는 고급 창녀를,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는 첩을 그리고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처를 갖고 있다”고 했다.
소크라테스나 페리클레스가 사랑한 여인이 재색을 두루 갖춘 창녀였다니 그의 말은 당대의 유행을 반영한 모양이다.

유럽사를 뒤지다 보면 여성 비하의 실상이 못 말릴 정도란 걸 알게된다. 중세의 스승이었던 교부(敎父)들은 여성이 화장하고 목욕하는 것을 두고 음탕함을 부추기는 악마와의 결탁이라고 했다.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자인 페트라르카마저도 “여성은 말(馬)보다 못하다”고 했으니 ‘레이디 퍼스트’ 전통이 차라리 무색하다.
인제대 이광주 명예교수가 쓴 ‘베네치아의 카페 플로리안으로 가자’(다른세상 펴냄)는 유럽문화의 본질을 전하기 위해 책의 1부 ‘유럽의 정념’에서 풍속사 속의 디테일을 끄집어 낸다.
‘방랑과 순례-왕과 성직자도 나그네였다’란 장을 읽다 보면 ‘여행하는 자’(호모 비아틀)란 타이틀을 인류에게 붙여줘도 괜찮을 듯하다. 프랑수아 1세는 1533년 새해 아침을 맞은 파리 루브르 궁전에서 1~2월을 보냈는데 당시 3개월 동안 파리에 머문 건 하나의 사건으로 쳤다. 봄이 오는 3월부터 왕은 지방 순회에 나서 한 곳에서 하루나 기껏해야 3~4일 정도를 머물렀다. 리용에서 한달 머문 것을 한 역사가는 ‘기적’이라고 했다.

그럼 왕은 왜 진득하니 한 곳에 머물지 않은 걸까. 16세기에 이르도록 유럽에선 토지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아 봉건 영주들이 ‘싸돌아다니며’ 땅관리를 했던 것이다. 왕 노릇 해먹기 힘들었다는 얘기다.
중세사회에선 왕만 그런 게 아니었다. 성직자 학생 상인 광대도 죄다 돌아다니기 바빴다. 유럽 관광안내 책자가 꼼꼼한 것도 이런 문화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중세의 일상적 관행이었던 방랑과 순례를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세계주의적 경향과 결부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사람들은 개인적 불안에서 벗어 나거나, 보다 나은 생활을 찾기 위해, 혹은 영혼의 갱생을 기원하며 집과 고향을 떠났다고 설파했다.
책의 1부가 유럽문화의 토대가 된 고대 그리스 사회의 원형질, 여신상에 담긴 미의식, 12세기에 피어난 ‘사랑의 미학’에 대한 고찰을 통해 유럽의 본질에 다가갔다면, 2부 ‘살롱과 카페 이야기’ 3부 ‘유럽, 담론하는 공동체’는 유럽을 교양과 담론의 공동체로 규정짓는 근거를 보여준다.

폴리스, 아고라, 플라자, 포럼이란 말을 낳은 광장문화야말로 유럽을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말하는 저자는 광장문화의 연장선에서 17~18세기 프랑스에서 꽃을 피운 살롱과 카페 문화에 접근한다.
미모 교양 인품으로 귀족과 고위 성직자를 끌어들여 프랑스 최초의 문예살롱을 일궈놓은 랑부예 후작 부인의 살롱을 비롯해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디드로 미라보 흄 등 유럽 사상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들이 살롱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학문세계를 펼쳤는지 소개한다.
취미와 예절, 교양과 학문을 나누며 여론까지 형성한 18세기 파리의 살롱은 계몽사상가들의 ‘전투 사령부’였으며 프랑스 혁명의 모태였다는 사실을 통해 저자는 살롱문화가 유럽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강조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카페문화를 높이 평가한 저자는 이 책에 낭만적인 제목을 선사한 베네치아의 카페 플로리안 내부를 상세하게 그려 보인다. 1683년 문을 연 이탈리아 최초의 이 카페는 귀족과 시민들의 휴식처에서 시작해 뉴스와 정보의 발신지, 도박과 매춘의 소굴, 외세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의 근거지, 예술가들의 사교공간으로 바뀌어 온 내력을 통해 유럽인의 기질과 카페문화의 관계를 정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카페문화를 높이 평가한 저자는 이 책에 낭만적인 제목을 선사한 베네치아의 카페 플로리안 내부를 상세하게 그려 보인다. 1683년 문을 연 이탈리아 최초의 이 카페는 귀족과 시민들의 휴식처에서 시작해 뉴스와 정보의 발신지, 도박과 매춘의 소굴, 외세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의 근거지, 예술가들의 사교공간으로 바뀌어 온 내력을 통해 유럽인의 기질과 카페문화의 관계를 정리한다.
저자는 이밖에 유럽의 출판 및 인쇄 역사, <백과전서>의 의미, 17~18세기 유럽 지성사의 단면을 설명하면서 유럽사회를 여물게 한 원동력과 구조적 틀을 알기 쉽게 풀어낸다.263쪽. 1만4천원.
김태수 <동아닷컴 기자> tskim@donga.com
사족: 편집자에게 한마디 한다면 챕터를 개념별로 짜임새 있게 정리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거다. 도판 설명에 좀 더 세심하고 각주도 아끼지 않았으면 책의 가치가 한층 높아졌을 텐데 아쉽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닥터트래블]페리-열차패스 이용 39만원에 日 일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1/06/06/6821760.1.jpg)


![트럼플레이션이 부른 美 ‘둠 스펜딩’ 바람[횡설수설/김재영]](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81050.2.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