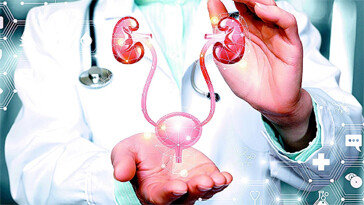이 둘의 전제엔 뚜렷한 명분이랄까 신념이 깔려 있다고 했소. 인간은 이성의 힘으로 세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명제가 그것이오.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란 과연 과학적인 것일까, 한갓 헛것일까. 인간 영혼 속 깊은 곳까지 통찰한 대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를 두고 ‘악령’ 속의 한 인물의 입을 빌려 인류가 발명해 낸 가장 황당무계한 망상이지만 모든 민족은 이것 없이는 살기는커녕 죽을 수조차 없다고 갈파했소.
▼인류사와 함께 한 예술▼
인류사! 이것만큼 가슴 설렌 울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 인류사와 나란히 가는 도상의 예술 양식이 소설이라면 소설만큼 가슴 설렘의 형식이 달리 있을까. 중심이 하나인 이 둥근 원으로 된 역사·사회학적 상상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세대가 있었소.
20세기 전반부터 태어나 철날 무렵 일제와 미국식 교육제도에 침윤되고 6·25전쟁을 통과해 온 세대, 러시아어 사전 지니기도 금기사항이었던 반공을 국시로 하는 바람과 흙 속에서 자국의 근대문학 공부에 나아간 세대 말이오.
그들이 바라본 이 나라 근대문학이란 어떠해야 했던가.
국민국가와 자본제 생산양식에 의해 무자비하게 헐뜯기는 한민족의 운명이자 동시에 그 운명의 타개방식의 위대함이었소. 인간의 위엄에 어울리는 표상, ‘인간은 벌레가 아니다’로 요약되는 생각과 정서가 언어갈피 속에 은밀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던가. 그 연장선상에서 분단문학과 노사문학이 우람하게 전개되었소.
이러한 현상이 이성의 힘으로 세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명제 속에서 싹튼 것인가, 아니면 그런 명제 자체 속에 깃든 악마적 요소에 대한 반응 방식이었을까.
이런 물음을 피해갈 수 없는 시기가 찾아왔소. 동유럽 및 구 소련 해체로 표상되는 역사·사회학적 상상력의 불신 또는 거기에 깃든 악마적 요소의 드러남이었소. 우리가 갈 수 있고 또 가야 할 길을 가리키던 저 창공의 별이 돌연 사라진 형국. ‘역사의 끝장’ 의식에 사로잡혔소.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소설읽기에 한층 힘 쏟기가 그것이오.
소설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층위로 이루어진 일정한 관습적 언어의 조직체가 아니겠소. (A)작가의 의도적 층위 (B)작가의 무의식 층위 (C)작가가 속한 시대적 사회적 집단무의식의 층위들이 그것. (A)의 판독은 쉬운 일. (B)의 판독엔 상당한 집중력이 있어야 될 터. (C)의 판독이 가장 어려운데, 모종의 징후로만 감지되는 법이니까. 이 징후야말로 소중한데, 역사의 끝장 이후의 나아갈 방향성의 징후일 테니까요.
‘은어낚시통신’(1994·윤대녕) 속에 모종의 예감이 감지되었소. ‘인간은 은어(연어), 메뚜기, 철새다’라는 것. ‘인간은 벌레다’의 명제. 생물학적(실은 동물학적) 상상력에로의 거대한 전환이 아니겠소.
▼사회적 징후 담아▼
생물로서의 인간으로 재규정될 때, 그 줄기에 생명사상, 생태사관, 환경문제, 그리고 DNA 연구에로 상상력의 지평이 엿보였소. 이 상상력의 유효성은 또 얼마나 지속될까. 응당 이런 의문이 우리 앞에 덩그렇게 걸려 있었소. 생물 자체가 위협 앞에 전면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니까. 동물이 바야흐로 생명 범주에서 소멸되는 장소. 그 징후로 드러난 것이 ‘민들레씨앗’(김지하)이 아니었겠소. 동물적 이미지에서 식물이미지에로의 전환이 그것. 또 하나의 끝장의식이 겹쳐왔소. 사이버 공간의 무한대 앞에 활자로서의 소설은 포자(胞子)로 번식하는 버섯이미지(김춘수)에 닿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제 소설읽기였소.
전위 속의 후위란 말이 있소(R 바르트). 전위이기에 무엇이 죽어 가는가를 아오. 후위인 것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오.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민들레 씨앗, 버섯의 포자를.
김 윤 식(명지대 석좌교수·문학평론가)
연예계 x파일 : 입장·대응 : 제일기획 >
-

사설
구독
-

이주현의 경매 길라잡이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