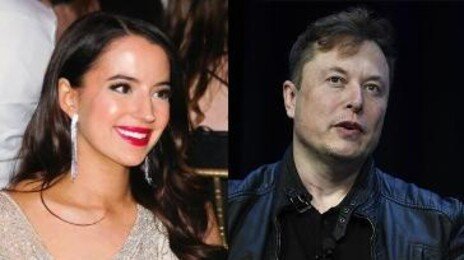정보공개법은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요건도 불명확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바로 이러한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다시 한번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여덟 가지 비공개대상 정보 이외에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상당한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정보’,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의사결정에 참여한 당사자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손상을 주는 정보’가 새로 추가되었다.
새로 비공개대상 정보로 추가된 내용을 보면 기존의 비공개대상에 비하여 그 요건이 훨씬 불명확하고 추상적임을 알 수 있다.
도대체 ‘국민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모든 법치국가의 법률은 국민이 알기 쉽고 예측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그 표현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 중의 원칙이다. 법률의 내용이 모호하고 그 요건이 불명확하여 국가에 의한 남용을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을 ‘국가기밀보호법’으로 전락시킬 중요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은 주택가에 들어선 러브호텔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부여된 것인지 추궁하게 했고, 시장의 판공비 사용 명세를 공개하여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지출행위를 감시하게 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무슨 이유로 외유를 했는지 또한 거기에서 무슨 일들을 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정보공개법이 이룬 성과인 것이다.
이제 정보공개법은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 공정하고 투명한 국가활동을 세우기 위한 이른바 ‘공익적 정보공개’를 위한 제도로 탈바꿈하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국민은 단순히 국가의 통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시대를 마감하고 행정의 동반자로서 자리매김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정보공개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의 밀실행정과 추악하고 부패한 권력놀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공개법은 행정개혁법이며 진실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김성수 (연세대 교수·공법학)
월드컵 : 8강전 >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월드컵]축구토토 참가자 58% “한국 8강 진출할 것”](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