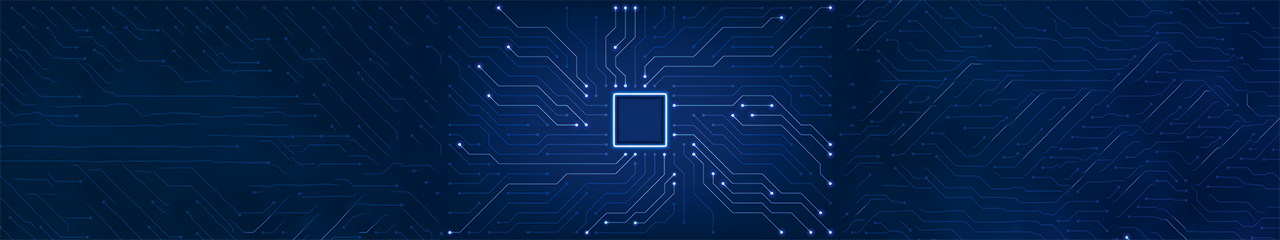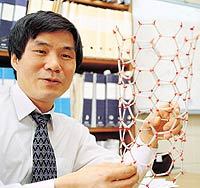
1998년 서울대 임지순 교수(물리학과)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연구팀과 함께 탄소나노튜브는 한 가닥일 때는 도체가 되지만 다발이거나 모양을 변형시키면 반도체가 된다는 것을 밝혀내 탄소나노튜브가 반도체 소자로 이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연구결과는 네이처에 게재됐다.
탄소나노튜브 트랜지스터는 1998년 네덜란드 델프트대학 데커 교수팀이 처음 개발했다. 그 뒤 IBM에서도 같은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전극 위에 탄소나노튜브 다발을 뿌려놓은 다음 전자현미경이나 원자현미경으로 제대로 연결된 것만 찾아내거나 아니면 원자현미경 탐침으로 탄소나노튜브를 원하는 곳으로 일일이 끌어다 놓는 주먹구구식 방법을 이용했다.
이에 비해 삼성종합기술원 최원봉 박사, 전북대 김주진 교수(물리학과) 공동연구팀은 탄소나노튜브를 산화알루미늄 기판 위의 구멍에서 수직으로 합성해 탄소나노튜브의 지름과 간격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처음으로 실용화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를 이용하면 테라비트(1조비트)급 집적도를 가진 반도체 소자를 개발할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디스플레이에도 이용될 수 있다.
1999년 삼성종합기술원 김종민 박사는 탄소나노튜브 평판디스플레이 FED를 개발했다. 김 박사는 당시 탄소나노튜브 조각들을 풀 형태로 만들어 평면에 바른 다음 전류를 흘려주자 탄소나노튜브에서 전자가 튀어나와 삼원색 도료를 칠한 화면을 때려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했다. 김 박사와 임 교수는 그동안 연구를 진척시켜 최근에는 탄소나노튜브를 일정한 형태로 배열하고 탄소나노튜브 박막과 삼원색 화면 사이에 제3의 전극을 설치, 전자 방출 효과를 훨씬 높여 동영상까지 구현한 디스플레이를 개발해냈다.
원자현미경은 탐침 원자와 관측 대상 원자 사이의 힘의 차이를 측정, 생체분자까지 관찰할 수 있는 최첨단 현미경이다.
탄소나노튜브를 탐침으로 이용하면 분해능력이 기존의 30㎚에서 5㎚로 증가한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김필립 교수는 1999년 탄소나노튜브 탐침을 두 개로 만들어 서로 밀고 당기는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 나노 크기의 물질을 집어 옮길 수 있는 나노집게를 개발,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나노집게는 생물세포 조작이나 나노 크기의 기기를 만드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영완 동아사이언스기자>puset@donga.com
▼타노나노튜란…▼
탄소나노튜브는 탄소 6개로 이루어진 육각형들이 서로 연결돼 관 모양을 형성한 물질이다. 관의 지름이 수∼수십㎚(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로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이다. 구리와 전기전도도가 비슷하고, 열전도율은 자연계에서 가장 좋다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강도는 철강보다 100배나 뛰어나다. 가장 가늘면서도 강한 것으로 알려진 탄소섬유는 1%만 변형돼도 끊어지는 반면 탄소나노튜브는 15%의 변형에도 견딜 수 있다. 말하자면 전기가 잘 통하고 열을 잘 발산시켜 안정된데다 강도와 탄성이 뛰어난 꿈의 신소재인 셈이다.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베스트 서핑/여행정보 사이트]다투어 등](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