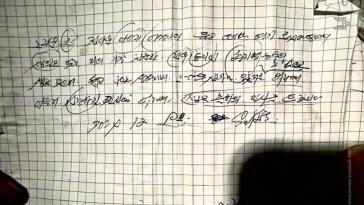큰 사건에 묻혀 소홀히 다뤄진 기사가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첫 외국인 감독으로 부임한 스웨덴 출신의 스벤 에릭손에 관한 것. 그의 활약상이 체육기사로는 충분히 다뤄졌지만 그의 등장이 영국에, 그리고 한국에 주는 의미에 소홀했다.
| ▼관련기사▼ |
- ①英축구대표팀 에릭손감독 상징성 |
영국인들은 에릭손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66년 잉글랜드 월드컵 우승의 주역인 보비 찰튼경조차 “큰 실수”라고 말해 축구 종주국으로서의 상처받은 자부심을 대변했다.
하지만 영국인이 정작 자존심 상해야 할 대목은 기업의 헤드코치라고 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CEO)의 구인난이었다. 이미 영국은 국가대표팀 감독 이전에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CEO들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영국을 대표하는 항공사 중 하나인 브리티시 에어웨이는 지난해 5월 호주 출신의 로드 에딩턴(52)을 CEO로 영입했고 역시 세계 전역에 소매 체인망을 갖고 있는 117년 역사의 마크스 앤드 스펜서도 지난해 벨기에 출신의 루크 반데벨데(51)를 CEO로 모셨다.
산업혁명 이전인 1690년에 창립돼 31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금융회사인 바클레이스도 지난해 CEO가 외국인으로 바뀌었다. 올해 12월10일에는 국영기업이었던 매출액 300억달러의 브리티시 텔레커뮤니케이션스가 16개월 동안 CEO감을 찾고 찾다가 결국 네덜란드 출신의 벤 베르와엔(49)을 낙점했다.
축구 종주국보다는 자본주의 종주국으로 더 기억되길 바랄 영국이 CEO의 주요 수입국이 되고 있는 마당에 에릭손의 영입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
물론 외국인 CEO를 영입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과 개방적인 태도는 평가할 만하지만 자국 내에서 실력 있는 CEO를 배출하지 못하는 교육과 사회 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자신도 외국인 오너에게 넘어간 영국의 대표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미국과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며 “우리의 사회, 교육제도는 왜 잭 웰치와 같은 탁월한 경영자를 배출하지 못하는가”라고 개탄했다.
월드컵 예선 전적 1무1패의 잉글랜드 대표팀을 인수받은 에릭손은 5승1무의 화려한 전적으로 잉글랜드의 예선통과를 지휘함으로써 손상된 영국인의 자부심을 몇배 보상해줬다.
앞으로 외국인 CEO들도 영국기업에 에릭손 같은 존재가 될지 모른다.
여기서 얘기가 좀 튀지만 한국 국가대표팀의 거스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 본선에서 16강에 올라 잉글랜드의 에릭손을 격파할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히딩크뿐이다. 상장기업중 한국인 대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외국인 CEO는 전무하다. 경영에 관해서는 한국이 이미 영국을 제친 것일까. 우리의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한가.
그런 얘기를 미처 쓰지 못했다.
<홍은택기자>euntack@donga.com
보험사 탐방 >
-

고양이 눈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보험사 탐방/대한화재]작년상반기 111억원 순익](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