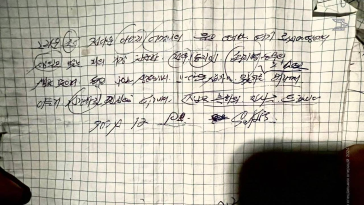촉망받는 수학자인 강석진(姜錫眞·40) 박사는 지난 여름 서울대 교수직을 내던졌다. 그리고 국내의 한 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대 교수를 그만둔 것은 국내 대학에서는 학자로서도, 교육자로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없겠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
강 박사는 “강의 시간이 많고 각종 행정 업무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된 연구는 엄두도 못냈다”며 “유학시절 함께 공부했던 외국인 동료들이 피나는 연구활동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도하라운드에 따른 교육서비스의 대외 개방을 앞두고 외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이 49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육 만족도는 2000년 43위에서 2001년에는 47위로 떨어져 최하위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 교육이 사회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교수들의 연구 실적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수록된 국내 논문은 2000년 현재 1만2232편이고 인구 1만명당 논문수가 2.56편으로 세계 29위에 불과하다. 논문의 질적 수준은 더욱 낮아 최근 5년간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 학술지에 인용되는 횟수가 편당 1.96회(세계 60위)로 세계 평균(3.98회)의 절반 수준이다.
연세대 유석춘(柳錫春·사회학) 교수는 “자기만의 깊이 있는 학문보다는 외국에서 유행하는 학문 조류를 재빨리 수입하는 교수가 주목받는 것이 한국 학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발표된 논문 중에도 제자가 쓴 논문에 슬쩍 이름을 올리거나 다른 학자의 저술을 표절한 사례도 많다. 지난달 국내 교수들이 외국 대학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베껴 미국전자전기공학회(IEEE) 산하 통신학회지에 게재했다가 사과문까지 싣는 등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교수신문이 4월 전국 대학교수 277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29%가 논문 표절과 베끼기가 심각하다고 인정했다.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도 수준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세계적인 석학 6명으로 구성된 서울대 최고자문위원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생 89%가 ‘대학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연세대 한준상(韓駿相) 교육대학원장은 “교수의 지식 수준과 전달 능력은 별개”라며 “국내의 많은 교수들이 효과적인 교수법을 익히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 교육과정이 산업 수요와 맞지 않아 대학 졸업자라도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없어 재교육을 시켜야 하는 실정이다.
안승준(安承準) 삼성전자 인사담당 상무는 “신입사원의 경우 3년은 돼야 겨우 일할 정도”라며 “기업이 대학졸업자의 재교육 비용을 떠안는 바람에 기업과 국가 경쟁력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각 대학이 변신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보수적인 대학 문화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방 국립대를 컨설팅한 L씨는 전교생이 1만명도 안되는 규모에 부속기관이 30개 가까운데도 연구실적이 거의 없었고, 보직교수와 행정직원 등이 필요 이상으로 배치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러나 교수들이 “대학을 모르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며 물고 늘어져 결국 보고서는 휴지가 되고 말았다.
L씨는 “대학 사회의 이기주의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했다”고 말했다.
또 자기 학교 출신만 교수로 뽑으려는 관행도 똑같은 학문만 대물림하는 풍토를 만들어 결국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다. 서울대의 본교 출신 교수 비율은 95.2%, 연세대는 80.9%, 고려대는 62.6%나 된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학과 교수들이 거의 선후배여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스승의 학문을 흉내내는 분위기에서 좋은 연구가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대 최고자문위원단도 “서울대가 세계 수준의 대학이 되려면 외국인 학자를 많이 유치해 학문의 ‘근친교배’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여건도 교수의 연구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성균관대 홍승우(洪承宇·물리학) 교수는 “교수가 부족해 강의시간이 많은 데다 학과업무, 입시 업무, 각종 교내 위원회에 차출되다 보면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K대 총장은 “젊은 교수 중에서도 연구와 강의보다는 보직만 맡으려는 교수들이 있다”며 “아예 ‘교육교수’와 ‘행정교수’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
▼국내大 연구비총액 美2개대학보다 적어▼

한국 대학의 연구 실적과 연구비는 과연 어느 수준일까.
지난해 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실린 국내 논문은 1만2232편으로 99년에 비해 10.5% 늘어나 세계 16위였지만 논문 수준은 형편없다는 것이 학계의 자평이다.
지난해 SCI에 3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대학은 세계 42개국 544개 대학이었는데 이 중 국내 대학은 12개에 불과했다.
미국 하버드대는 8278편(1위), 일본 도쿄대는 5921편(2위)이었지만 서울대는 2022편(55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196편(160위), 연세대는 904편(222위)에 불과했다.
지난해 국내 학자의 논문 중 316편만 평균 인용횟수가 10회를 넘는 저명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고 나머지는 10회 미만의 학술지에 발표됐다. 일본은 1460편이 인용횟수 10회 이상의 저명 학술지에 실렸다.
91년부터 99년까지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 1인당 논문 건수는 도쿄대 248편, 하버드대 221편이었지만 서울대는 56편이었다.
인색한 연구개발비 투자도 대학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99년 현재 한국의 총연구개발비(GERD)는 국내총생산(GDP)의 2.46%(11조9218억원)로 미국의 13분의 1, 일본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특히 국내 대학은 전체 박사급 인력의 76.8%를 ‘독점’하면서도 연구비는 GERD의 12%에 그치는 등 기업체나 연구기관보다 연구조건이 열악한 수준이다.
전국 193개 4년제 대학의 총연구비가 1조1569억원인 데 비해 스탠퍼드대는 한국의 전체 대학 연구비의 50% 수준인 4억1700만달러(약 5421억원)나 될 정도로 연구비 격차가 크다. 또 서울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이 4만 달러(한화 5200만원)에 불과해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하려고 해도 열악한 처우와 연구환경 때문에 성사되지 않고 있다. 고등과학원 명효철(明孝喆) 교수부장은 ”국내 대학은 급여체계가 경직된데다 교수들의 거부감 때문에 파격적인 대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용기자parky@donga.com>
최희암의 버저비터 >
-

기자의 눈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송평인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최희암의 버저비터]전창진감독의 위대한 용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