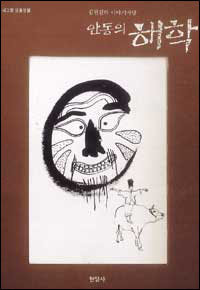
장례를 치른 영구차를 몰고 상경하던 운전기사가 그만, 길을 잃었다. 새벽 두시. 인적없는 산길이 무서웠지만 부지런히 액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마침내, 저 멀리 불빛이 보인다. 얼마쯤 갔을까, 갑자기 고래등같은 기와집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경적을 마구 눌러 대니 머리가 약간 벗어진 초로의 남자가 나왔다.
“서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남자는 대꾸도 없이 돌아선다.
“어르신, 이 집은 도대체 뭐하는 데요?”
이제, 서울가는 일보다 첩첩산골에서 만난 기와집에 흥미를 느낀 기사는 무례도 잊고 남자를 다시 불러 세웠다. 그러자 갑자기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에 무시무시한 대통령이 머무는 청와대라는 데를 아니껴? 아직도 박정희가 대통령하니껴?”
이게 왠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소리인가.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던 기사는 오던 길로 냅다 도망쳤다고 한다.
“하하하, 완전히 귀신을 만났다고 생각한거지. 엄동설한에 자다 일어나 런닝셔츠 바람으로 서 있는 나한테 자꾸 캐물으니 은근히 부아가 나잖아. 그래서 농담 한마디 한건데 말이야.”
|
이야기의 주인공인 초로의 남자는 경북 안동 의성김씨 지촌공파 13대 종손 김원길(金源吉·61·안동 예총회장)씨다. 김씨는 퇴계학파의 거두 학봉 김성일(金誠一·1538∼1593) 선생 백부의 증손자이자 조선 숙종때 대사간을 지낸 지촌 김방걸(金邦杰·1623∼1695) 선생의 종손. 10여년전 대학교수로 있던 김씨는 임하댐 건설로 선대의 유산인 고건축물 10여동이 수몰위기에 처하자 건물 모두를 안동시 임동면 박곡리 뒷산 자락에 옮겨 지었다. 4년에 걸쳐 이전 건축을 한 뒤 대학교수를 그만두고 ‘지례(知禮)예술촌’이라 이름붙여 운영하고 있다.
지례예술촌은 1664년 조선 숙종때 지어진 종택, 제청(제사 지내는 집), 서당 등 10여동 125칸의 복합주택으로 방만 17개다. 그동안 국내의 내로라 하는 시인 소설가 연극인, 외국의 유명 인사 등 무려 5000여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이미 명소로 자리잡았다.
지난 20일 김씨와 함께 마을로 들어서며 앞서 소개한 영구차 기사 이야기를 들었다. 안동시내에서 영덕방향으로 국도를 따라 임하호를 굽어 보며 30여분쯤 달리다 비포장 도로를 오르 내리며 다시 40여분을 더 갔다. 정말 고래등같은 기와집이 갑자기 나타난다. 야밤에 이런 풍경을 보고 반갑다는 생각보다 섬뜩하다는 생각을 했을 기사 생각을 하니, 슬며시 웃음이 난다.
|
고색이 창연한 솟을대문을 들어서 안채를 휘둘러 보니 340여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듯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간 느낌이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앞은 확트여 호수가 보이는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절경. 유럽에만 고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례예술촌은 한국판 고성이고, 김씨는 성주(城主)인 셈이다. 이 집에서 가장 전망이 좋다는 별묘(別廟)방에 앉으니 낮게 앉은 담이 멀리 보이는 산, 호수와 절묘한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바람소리 말고는 들리는 것이 없다.
김씨는 이야기를 참 재미나게 한다. 유머와 위트가 넘친다고 할까. 나지막한 목소리에 특유의 톤을 섞어 가만가만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웃음이 터져 나온다. 저 사람이 안동사람, 그것도 양반집 종손 맞아? 그에게는 유교적 이미지의 ‘고루하다’는 느낌이 없다. 안으로 종가를 지키면서도 밖으로 개방한 그의 유연함은 입담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가 펴낸 ‘안동의 해학’은 농경 제사 접빈 풍류 등과 관련된 구전 우스개 소리들을 모은 일종의 유머집이다. 우리 문학사에 유머는 당당하게 하나의 장르를 차지한다. 해학, 골계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정신적 긴장과 물질적 빈곤이 심할수록 사람들은 해학으로 어려움을 풀고 극복해 나갔다. 에피소드마다 넘치는 안동사람 특유의 숙맥과 엉뚱함 이면에는 당시 신문명과의 충돌에서 겪었을 우리들의 당혹감과 급속한 시대 변천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왔는지가 읽힌다. 농담의 사회학이라고나 할까. ‘선생님 먼저’라는 대목을 보자.
‘산골마을 맏며느리가 태기가 없었다. 문중 사람들 눈총과 수근거림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병원에서 해산한 서울댁처럼 읍내 산부일과엘 가서 난생 처음 신의(新醫)한테 진단을 받았다. 간호부가 “얼른 벗고 누우세요”한다. 아니, 벗고 눕다니. 남편 외에 누구에게도 살을 보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의사가 “아직 안 벗었어요?” 한다. 아, 산부인과에선 이렇게 잉태를 하나 보다. 등골에 찬 땀이 흐르는 걸 느끼며 용기를 내 침대위에 올라갔다. 의사가 또 “빨리 벗으소!” 한다. 종부는 울음섞인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먼저 벗으시소.”’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의성 김씨네가 겪은 실화들이지만 실제로 안동사람이라면 누구나 일생에 한번씩 겪고 즐긴 이야기들이다. 이야기마다 저자가 덧붙인 ‘군소리’편에는 촌철살인의 삶의 지혜가 담겨있다. ‘세월보기’라는 제목의 글이다.
‘새아기 이마가 증조부님 닮았다 소리를 들은 증조부가 “어디 내 이마만 닮았냐? 내 증조부님 이마도 닮았느니라”하신다. 옛날 사람은 이렇게 당대에 증조부 늙는 것도 보며 자라고 증손자 크는 것도 보며 늙었다. 자기 대를 합쳐서 7대를 보며 살았던 것이다. 누가 인생 70이 드물다 했나. 400년 세월이 한눈에 보이는데. 증손자를 안고 있는 노인은 과거의 조상과 미래의 자손 가운데 자기란 존재는 하나의 ‘고리’의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세월을 통시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런 인식은 당대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하며 영생경영의 주체가 되는 인식이다.’
김씨는 “미친 사람소리 들어가며 종가를 옮겨 수몰위기에서 구하고 이번에 이야기까지 복원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돌아간다해도 바보같지만 어질고 착한 우리 모습들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안동〓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레포츠]낚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1초 스캔으로 잔반 줄이고 건강 지키는 마법”[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6662.1.thumb.jpg)
![노안-난청, 잘 관리하면 늦출 수 있다[건강수명 UP!]](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4349.15.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