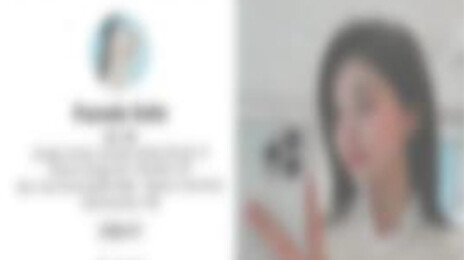태흥영화사 대표 이태원
칸의 낭보 뒤에는 충무로에서 가장 오랜 ‘좋은 친구들’인 임권택(林權澤·66)감독과 정일성(鄭一成·73) 촬영감독, 이태원(李泰元·64) 태흥영화사 사장의 우정과 눈물, 그리고 집념이 서려 있다.
‘비구니’(1983년)를 시작으로 이들이 함께 한 작품은 지금까지 30여편. ‘만다라’(1981년)부터 이미 호흡을 맞추고 있던 임권택-정일성 감독 콤비에 이사장이 ‘비구니’의 제작을 맡으면서 합류, ‘트리오’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들의 ‘궁합’은 그리 순조롭지 못했다. ‘노을’(1984년)부터 ‘도바리’(1987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못한 채 때때로 군사 정권의 압력으로 제작이 중단되기도 했다. 임감독은 ‘아제아제 바라아제’에, 정감독은 배창호 감독과 ‘황진이’에 매달리면서 한 때 이들은 각자의 길을 가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 이태원 사장이 “기분 전환 삼아 만들어보자”며 제의했던 ‘장군의 아들’로 다시 뭉친 이들은 서울 관객 80여만명을 끌어모으며 다시 저력을 과시했다. 이후 ‘서편제’에서 다시 뭉친 이들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서울 관객 100만명을 돌파했고, 2000년 ‘춘향뎐’으로 한국 영화로는 사상 처음으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 ‘레드 카펫’을 밟았다.
이들 ‘노익장 트리오’의 존재는 한국 영화계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다. 조폭과 코미디 영화 등 기획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적 정취를 필름으로 옮겨 온 이들 세명의 장인들은 언제나 ‘돈되는 영화’ 보다는 ‘한국의 영화’를 만드는데 진력해 왔다. ‘서편제’이후 흥행에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이태원사장은 지난해 차남이 ‘두사부일체’를 제작해 대박을 터뜨렸지만 “애들 장난하는 것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은 없다”며 개의치 않았다.
겉으로는 사뭇 다른 기질의 이들은 영화 밖에서도 절친한 것으로 유명하다. 진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는 임감독은 영화처럼 토속적이지만 원칙에서는 양보하는 법이 없고, 서울대 공대 출신의 정감독은 청바지에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즐겨 타는 ‘70대 신세대’이며, 괄괄한 성격에 육두문자를 마다않는 이사장은 어느 영화인 못지 않게 영화촬영 현장을 사랑하는 집념의 승부사다.
이들은 각자의 영화적 ‘인프라’를 공유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992년 이사장이 알고 지내던 가수 김수철을 임감독에게 소개한 뒤 ‘서편제’ ‘태백산맥’ 등의 영화 음악이 만들어졌다. 임감독은 이사장에게 철학자 김용옥씨를 소개해 ‘장군의 아들 1’의 시나리오를 쓰게 했고, ‘취화선’의 시나리오까지 맡게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뇌가보는세상 >
-

김지현의 정치언락
구독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뇌가 보는 세상]석면… 로켓… 뇌도 스트레스 받는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9/04/10/712140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