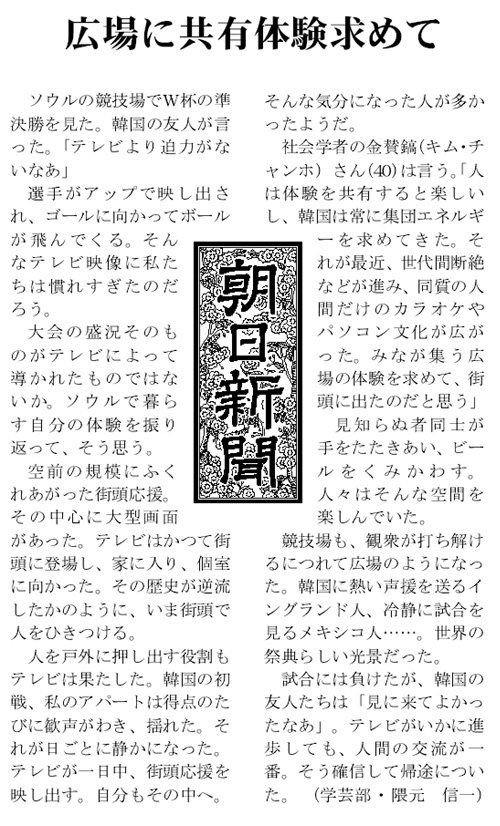
▼공유체험을 찾아 광장으로
서울의 상암동 경기장에서 월드컵 준결승전을 봤다. 한국인 친구가 말했다. “TV보다 박력이 없는 것 같은데…”
선수들의 모습이 클로즈업돼 방영되고 골을 향해 볼이 날아 든다. 그런 TV영상에 우리들이 너무 익숙해진 탓일 게다.
대회의 성황, 그 자체도 TV가 이끌어낸 것은 아닐까.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내 경험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전례없는 규모로 불어난 거리응원. 그 중심에는 대형화면이 있었다. TV는 예전에 거리에서 등장해서, 집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각 방으로 향했다. 그런 역사가 역류하는 것처럼 지금 거리에서는 TV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TV는 사람들을 집밖으로 내모는 역할도 했다. 한국팀이 첫 시합을 벌일 때 내가 사는 아파트는 한국이 득점을 할 때마다 환성이 일어났고, 아파트가 흔들렸다. 그러던 것이 날이 지나갈수록 조용해졌다. TV가 하루종일 거리응원을 내보낸다. 나도 저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다.
사회학자 김찬호(40)씨는 말한다. “사람들은 체험을 공유하면 즐거워지고, 한국은 늘 집단에너지를 추구해 왔다. 그런데 최근 세대간 단절이 진행되면서 동질의 인간만이 즐길 수 있는 가라오케와 컴퓨터문화가 확산됐다. 모두가 모이는 광장의 체험을 찾아 거리로 나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손뼉을 치고, 권커니 잣커니 맥주를 마신다. 사람들은 그런 공간을 즐기고 있었다.
경기장도 관중들이 융화되면서 서서히 광장처럼 변했다. 한국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는 잉글랜드인, 냉정하게 시합을 보는 멕시코인…. 세계의 제전에 걸맞는 광경이었다.
시합에는 졌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말했다. “보러 오길 잘했다”고. TV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교류가 제일. 그런 확신을 갖고 귀가길에 나섰다.
구마모토 신이치 학예부(한국연수중)
정리〓심규선 도쿄특파원ksshim@donga.com
밀레니엄 담론 >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경제 Inside Out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밀레니엄 담론]자본주의여, 인간의 얼굴을 보여다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 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76280.1.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