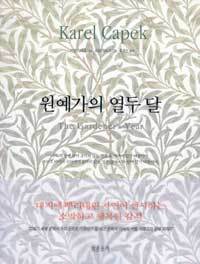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러나 꽃은 사람보다 아름답다. 이 역설(逆說)은 충돌하지 않는다.
‘사람을 키우듯 정원을 돌보라’는 것은 정원사의 금언이다. ‘꽃을 가꾸듯 사람을 키워라’는 것은 교육자를 위한 경구다. 이 정도라면, 사람과 식물은 거의 등가(等價)로 보아도 맞지 않을까?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정원 돌보는 이의 사계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정원사는 ‘프로’가 아니다. 날씨가 조금만 추워지면 허둥대고, 이런 흙이 좋다 저런 비료가 좋다는 귀띔에 단숨에 혹하고 마는 ‘자기 집 마당 전문’ 초보자일 뿐이다. 집에 돌아온 뒤에야 펜 대신 손삽을 잡는 이 ‘원예가’의 모습을 보자.
2월, 원예열(園藝熱)에 걸린 그에게는 이미 길가의 말똥도 예사롭지가 않다. “아아, 참으로 고마운 신의 선물인데,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주워갈 수 있다면….”
4월, 옮겨심기의 달. 들뜬 원예가는 안절부절하며 꺾꽂이 모를 백여 포기나 주문한다. “여기 심을까, 저기 심을까? 빈 데가 없잖아? 아, 저기 빈 자리가 하나 있군.” 이틀이 지나서야 원예가는 꺾꽂이 모 아래 달맞이꽃 새순이 돋아난 사실을 알게 된다.
6월, 중부유럽의 건조한 계절. 그는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 전지전능한 당신은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한밤 중 흙 깊숙이 잘 스며들도록 따뜻한 비를 내려 주십시오. 낮에는 종일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도록 해 주십시오. 복잡한가요? 원하신다면 종이에 써 바치겠습니다…”
8월, 휴가의 계절. 전원으로 떠나왔지만 집 정원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멋진 풍경도 엉뚱한 공상으로 번지고 만다. “저 산이 우리 집 정원에 있다면, 저 숲과 초원을 우리 마당에 옮겨올 수 있다면…. 아니, 저 수녀원도 우리 집에 가져올 수는 없을까?”
작심한 듯 한달 분량에 두어 건씩 폭발시키는 탁월한 ‘유머’만이 쉬지 않고 책장을 넘기게 만드는 미덕은 아니다. “딱딱한 배내옷을 입고 있던 싹이 부드러운 잎을 내밀고, 나긋나긋한 가지에 작은 황금별이 반짝이고, 작은 잎맥과 작은 결들이 서로 먼저 나오려고 기지개를 켠다. 결코 얼굴을 붉히며 찌푸리는 일이 없다….” 계절마다 펼쳐지는 정원의 묘사는 그 자체로 한편씩의 시다.
“만발한 가을 꽃의 풍요로움에 비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은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가져다준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유, 무엇일까? 당신은 그 이유를 모르는가, 마치 이 세상에 피곤함은 없다고 말하는 듯한 그 뜻을?”
차페크는 ‘로보트’란 단어의 창안자로 잘 알려진 체코의 극작가 겸 저널리스트. 이 책을 쓰던 1920년대 후반, 그는 연극과 여행기를 쓰고 대통령과의 담화록을 출간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나 신생 체코 공화국은 파시즘과 볼셰비즘이라는 양 극단의 투쟁 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시끄러운 시기에 왜 이런 ‘한가한’ 책을 썼을까? 소란한 시대일수록 정원사가 가꾸는 것은 다름아닌 ‘마음의 정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까?
이 책이 일본어판의 중역(重譯)판이라는 점은 잊지 않고 보고해야 하겠다. 출판사와 역자가 그 점을 솔직히 밝히고 있는데다, 번역된 문장이 매끄럽고 깔끔하기에 흠을 잡을 마음은 없어진다.
책 말미에는 본문에 소개된 식물종(種)들의 미니 사전이 들어있다.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
스타일 >
-

3시간의 행복, 틈새투어
구독
-

어린이 책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