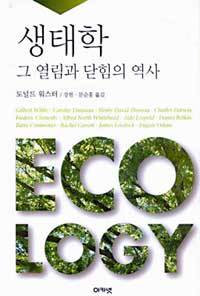
환경사의 거장으로 불리는 워스터의 책(원제·Nature’s Economy:A History of Ecological Ideas)이 한국어로 번역돼 나왔다. 수년 전에 출간된 클라이브 폰팅의 ‘녹색세계사’(심지)에 이어 환경사 관련 본격 저작으로는 두 번째이다. 한글로 읽을 수 있는 환경사 책은 이 두 개가 전부일텐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일이지만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역사학계의 무관심을 고려하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워스터는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던 1960년대에 역사학자들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환경문제의 역사를 평생의 연구분야로 삼은 후 많은 뛰어난 업적을 내놓은 학자다. 
그의 저술들은 주로 미국의 자연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고 변형되며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책으로는 1930년대에 대평원에서의 약탈농업(반환경적 농업)에 따라 미국 전역을 흙먼지로 뒤덮었던 사건을 다룬 ‘대황진(大黃塵·Dust Bowl)’과 서부 개발에 반드시 필요했던 물 확보 과정을 그린 ‘제국의 강(Rivers of Empire)’ 등이 있다. 그의 많은 저작 중에는 환경사상이나 환경운동에 관한 저작도 들어있는데, 이번에 번역돼 나온 이 책은 생태사상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환경사 거장 워스터 알기쉽게 정리▼
환경사는 현대 환경운동의 산물이다. 1960년대의 미국, 1970년대의 유럽에서 환경운동이 고조돼감에 따라 환경문제의 역사적 뿌리, 과거와 현재의 비교, 환경문제의 역사적인 전개과정 등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 것이다. 환경사가 환경운동의 결과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환경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두 환경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학문적 관심에서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고, 과거에도 대규모의 환경파괴가 있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현대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물론 초기에 환경사를 자기 연구분야로 삼은 학자들은 대부분 환경문제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환경사가 역사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이런 성향의 학자들이 줄어들고 ‘순수’ 환경사 연구자들이 늘어났다.
워스터는 환경사 개척 세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환경이용과 파괴에 대한 우려를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접했든 신화로만 알고 있든 미국의 ‘대자연’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가 다루는 환경은 하수, 분뇨, 쓰레기, 공장 오염물질로 덮인 도시가 아니라 인간의 손이 닿음에 따라 변형된 자연이다.
그가 원형으로 생각하는 자연은 백인이 이주하기 전 인디언만 점점이 흩어져 살던 그런 것이다. 그가 쓴 에세이인 ‘우리가 잃어버린 자연’에는 이런 자연이 향수병적 필치로 묘사돼 있는데, 그곳은 수백만 마리의 들소가 몰려다니고, 수백만 마리의 흰꼬리 사슴이 풀을 뜯고, 50억 마리의 평원 들개와 수십억 마리의 철비둘기가 와글대던 곳이다. 물론 지금 이들 동물은 모두 사라져버렸지만, 워스터의 여러 글들에는 이들이 살아있던 시절의 자연이 원형의 자연으로 상정돼 있다.
워스터의 이 책은 생태사상의 역사를 다룬 것이지만 여기에도 자연에 대한 그의 입장이 스며 있다. 이 책에서 그가 다루는 길버트 화이트, 데이비드 소로, 찰스 다윈, 알도 레오폴드, 제임스 러브록 등의 생태사상가들이 대부분 원래의 자연을 찾아다니고 그것에 대해 사색한 사람들이다. 이들과는 성격이 다른 레이첼 카슨, 유진 오덤, 배리 카머너, 클레멘츠 등도 워스터의 성향에 반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미국인으로 미국의 자연을 대상으로 생태학을 연구했거나 그 파괴에 대해 경고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워스터는 자신의 입장에서 선별한 이들 생태사상가들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유럽의 자연관에 대한 짤막한 소개로 책의 첫 장을 연다. 그리고 나서 소로를 시작으로 많은 생태사상가들의 생각, 업적, 영향에 대해 서술해 나간다.
그의 서술은 생태사상을 시대적, 문화적 연관성 속에서 읽기 쉽게 정리해 준다. 오덤, 에드워드 윌슨, 러브록 같은 현대 연구자들에 대한 서술 역시 핵심을 전하면서도 어렵지 않다. 특히 생태학에 물리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정량적인 것으로 만들려 한 맥아더와 윌슨을 자연에 대한 유기체적 관점을 지키려 한 오덤 형제와 비교하면서 이들 각각의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그의 탁월한 과학 이해 능력을 보여준다. 이 책의 아쉬운 점은 유럽 대륙의 생태사상이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책을 독일의 전일적 자연관에 주목하는 안나 브램웰의 ‘20세기 생태학’과 비교해서 읽으면 더욱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균형을 위해서는 브램웰의 책을 함께 읽는 것도 좋다.
▼들소떼 질주하는 자연 이상향 삼아▼
워스터의 역사 서술은 깊이를 잃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읽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책은 초기 저작이고 사상과 과학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대황진’이나 ‘제국의 강’ 같이 흥미진진하게 읽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읽어가다 보면 번역서임에도 상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여기에는 역자들의 매끄러운 번역도 기여했을 것이다.
이필렬(한국방송대 교수·과학사) prlee@knou.ac.kr
김동주의 여행이야기 >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동주의 여행이야기]태국 매홍손 '카렌족의 여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10/21/690577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