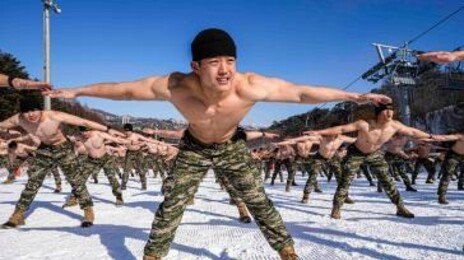▷이후 1년, 반테러 대책이 선진국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눈에 띈다. 미국에서는 아랍계 시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영국은 지난해 반테러 보안법을 통과시켜 테러 용의가 있는 외국인을 재판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개인통신 및 신용정보를 정부가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호주는 수백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소에 구금했다가 그곳의 비인간적인 상황이 폭로되자 반테러를 둘러댔다.
▷세계 인권단체들은 9·11테러 이후 선진국들이 반테러를 내세우며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 문제에서 눈을 돌리면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폭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적어도 15개국이 반테러 명분 하에 이민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선진국은 밀려들어오는 이민자 및 난민에 대해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인권존중 차원에서 관용 자세를 취해 왔는데 반테러가 이들을 억압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된 셈이다. 이는 상당부분 이들 선진국의 우경화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어느 정도 ‘강 건너 불’ 입장인 우리지만 왠지 80여년 전 일본 관동 대지진 사태가 떠오른다. 대지진으로 도쿄 등 관동지방 일대가 큰 혼란에 빠지면서 무정부상태가 되자 일본정부는 재빨리 이를 조선인, 중국인 및 사회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선전하고 탄압하면서 민심수습에 이용했다. 무고한 민간인을 희생시키는 테러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다. 그러나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다른 형태의 테러가 행해진다면 이 또한 역설의 죄악이다. 테러를 낳는 반테러는 또 다른 모습의 테러일 뿐일 테니까.
김장권 객원논설위원 서울대 교수·정치학 jkk@snu.ac.kr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 >
-

2030세상
구독
-

사설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국영화를 이끌 감독들]'충무로 반항아' 임상수 감독](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