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쟁 영웅에서 평화의 사도로 변신해 칭송을 받던 라빈이 사라진 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는 다시 악화됐다. 현재는 죽고 죽이는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 양국 국민은 평화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노벨평화상은 과거의 업적에 대한 평가일 뿐 수상자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증서 또한 아니다.
북한의 핵 개발 시인으로 촉발된 위기상황에서 노벨평화상을 떠올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이 정권의 유일무이한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의 입안자이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의 성과가 김 대통령의 몫이듯 그림자 또한 그의 몫이다.
핵문제에 직면한 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백보를 양보해 제네바합의는 우리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치자.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등을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깬 것에 대한 분노나 유감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 결과 핵문제는 93, 94년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시작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3차례의 북-미 회담이 열렸다. 93년 6월 1단계 회담에 이어 7월에 2단계 회담이 제네바에서 열렸고 파리특파원이던 필자는 현장으로 달려가 처음으로 핵문제와 부닥쳤다.
당시 한국은 제3자에 불과했다. 북-미 회담이 끝나면 미국측으로부터 요약설명을 듣는 게 고작이었다. 미국이 회담상황을 100% 전달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다. 게다가 한국 외교관들은 종종 미측의 설명 가운데 핵심은 ‘보안’을 이유로 숨겼다. 만약 한국이 회담 당사자로 나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고 남북한과 미국이 공동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비열하게 핵문제를 터뜨리지는 못 했을 것이다.
북한에 따질 것을 따지지 못하면서 미국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듯한 상황이 걱정이다. 한미일 정상의 합의만 해도 주조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가 외치던 ‘대화’는 사라지고 대신 ‘평화적 해결’이 들어섰다. 평화적 해결은 전쟁만 배제할 뿐 외교 경제적 제재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정설이다.
문제는 햇볕정책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시작됐다. 정책이란 상황변수를 고려해야지 불변의 것일 수는 없다. 그동안 수정 보완해야 할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북한과 갈등을 빚어도 안 되고, 북한에 화를 내서도 안 된다는 말인가. 라빈은 목숨까지 바쳤지만 평화 정착에 실패했다. 김 대통령이 체면이나 고집 때문에 햇볕정책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평화정착이 과연 가능할까. 노벨평화상의 비극을 피하려면 무오류(無誤謬)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빈이 남긴 말을 되새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을 잘 활용해야 한다”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
씨네@메일 >
-

BreakFirst
구독
-

내가 만난 명문장
구독
-

허진석의 톡톡 스타트업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씨네@메일]'인터뷰'에 대한 찬사와 저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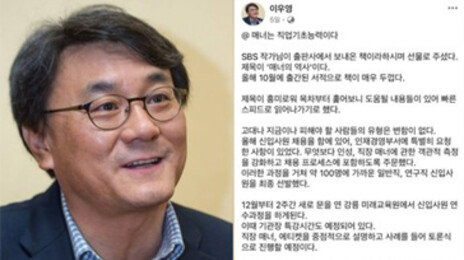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제 패스 받아서 골이 터지면 이강인 부럽지 않아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0612.3.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