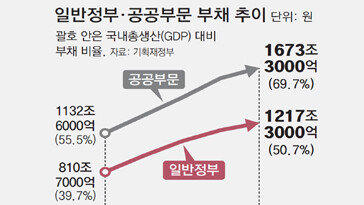◇천년 궁궐을 짓는다/신응수 지음/248쪽 1만2900원 김영사
개인사를 들여다볼 때 평범한 사람이 있을까. 겉보기로야 ‘보통사람’일지라도 저마다 살아온 삶의 굴곡이 있고 이야기가 있다. 하물며 한 분야의 ‘대가’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갖은 사연을 숨기고 있는 것은 당연할 터.
이 책을 지은 신응수씨(60)의 삶도 마찬가지다. 1991년 대원군이 사업을 벌였던 이래 100년 만이라는 경복궁 중건의 도편수(건축의 최고 책임자)를 맡으면서 이름을 알린 뒤 이제는 고건축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자리가 세월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목수 경력 45년. 땀과 눈물, 회한과 보람이 교차하는 인생이 있었다.
이 책은 저자가 살아온 발자취를 담담하게 되짚었다. 앞 부분은 저자가 대목장(도편수)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들뜨지 않은 어조로 들려주고, 중간 이후로는 목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고건축에 관한 견해와 철학을 적고 있다.
가난 때문에 목수의 길로 들어섰다가 대목 이광규를 만나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부편수(도편수 아랫자리)에 올랐던 이야기며, 75년 뜻하지 않게 수원성 복원의 도편수가 되면서 흥분보다는 책임감에 몸을 움츠렸던 이야기는 톱밥 묻은 개인사의 한 토막이다. 지어진 모양이 옛 사진의 모습과 다른 것을 알고는 완공된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은 경복궁 건순각(健順閣)의 일화는 무슨 일이건 대충 넘어가지 못하는 그의 고집을 말해준다.
저자는 황금 단청으로 아름다움을 더한 구인사 조사전(救仁寺 祖師殿)을 평생의 역작으로 스스로 치켜세우며 만족해했고, 뒤늦게 발견한 옛 그림으로 원형을 확인했지만 공사 기간에 맞추느라 일부를 원형과 다르게 올린 수원 장안문을 못내 아쉬워했다.
그의 이력을 엿보는 것도 재미이지만, 저자가 일궈낸 일을 통해 우리네 옛 건물의 우아함과 선인의 지혜를 느끼는 것도 흥미롭다. 고건축의 재료로 쓰일 소나무를 선별하는 법부터 세월이 흘러 목재가 수축될 때를 내다보며 처마의 곡선을 맞추는 일까지, 고궁과 한옥에서 흔히 보던 고건축의 숨은 아름다움을 새삼스럽게 일깨운다. 도리(기둥과 기둥 위에 둘러 얹는 재목) 장혀(도리 밑에 도리와 같은 방향으로 놓은 부재목) 연목(경사에 따라 도리에서 처마까지 건너지른 나무) 등 생소한 전통 건축 용어를 만나면서 목수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도 있다. 저자가 복원하고 또 새로 지은 건축물들을 찍은 정갈한 사진들은 고건축을 한층 가깝게 다가가도록 만들어 준다.
책을 읽고 난 뒤 문득 머리를 치는 의문. 이 책에는 저자가 몇 십년 전에 지은 고건축에 얽힌 사연은 물론, 어느 집 어느 기둥이 몇 치짜리인지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다. 일지라도 써왔던 것일까.
“내가 지은 건물은 주춧돌부터 기둥까지 모두 머릿속에 빼곡히 들어있어요.”
저자는 싱거운 질문이라는 듯 가볍게 대답했다.
주성원기자 swon@donga.com
스타일 >
-

이기진의 만만한 과학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