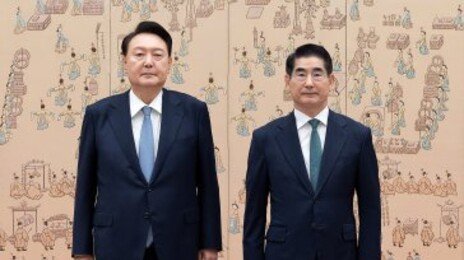‘정치의 미래’란 제목은 원저에서는 부제로 쓰인 것이다. 본 제목은 ‘The Radical Center’다.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올 봄이다. 평소 뉴욕타임스 북섹션 서평을 보고 책을 구입하는 선배로부터 ‘괜찮은 책이니 꼭 읽어 보라’는 권고와 함께 이 책을 전달받았다. 얼마 전 ‘제국의 패러독스’로 번역돼 널리 읽힌 조지프 나이의 ‘The Paradox of the American Power’처럼 논지가 명확하면서도 역사적 통찰력을 갖춘 상쾌한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센터’라는 말은 중도파를 의미한다. 중도파 앞에 붙인 ‘래디컬’이란 말이 흥미롭다. 좌파나 우파 앞에 래디컬을 붙인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지만 중도파에 래디컬을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첫눈에는 어색해 보이는 두 단어의 조합을 통해 저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제 중도파도 래디컬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1960년대가 좌파, 80년대가 우파의 시대라면 앞으로는 중도파의 시대다. 저자들은‘새로운미국(New Ameraca Foundation)’이라는 이름의 민간탱크에 속해 있는데 이 기구는 기존의 좌와 우, 민주당과 공화당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가간 경쟁은 기술개발의 경쟁 못지않게 제도개발의 경쟁이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미국도 변화하는 현실과 제도 사이의 불일치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저자들의 눈에 미국은 뉴딜(New Deal)시대의 제도적 골격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양당제에 기초한 최다 투표제는 그런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프랑스나 독일과 달리 최다 득표제를 택하고 있다. 2명이 대결하는 선거에서라면 최다 득표제가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3명 이상이 경쟁하는 선거에서는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최다 표를 얻으면 승리한다.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문제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당시 출마한 소비자운동가 랠프 네이더의 지지자 대부분이 앨 고어 후보를 선호했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네이더 후보가 고어 후보의 표를 흡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지 W 부시 후보의 당선을 도왔다. 마찬가지로 1992년 선거에서는 로스 페로가 아버지 부시의 표를 흡수함으로써 빌 클린턴 후보를 당선시켰다. 미국이 국민의 진정한 선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1992년 선거에서 아버지 부시가 당선됐을지도 모르고 2000년 선거에서는 아들 부시가 패배했을지도 모른다.
최다 투표제의 함정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1997년 선거에서는 김대중 후보가 30%대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대중 집권 5년의 특징은 소수파가 집권함으로써 초래된 정치적 무능이었다.
최근 노무현 정몽준 후보간의 단일화를 두고 야합 논란이 있었다. 이런 인위적인 ‘플레이오프’를 문제시하기 전에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정권을 탄생시킬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볼 때가 아닌가.
저자는 크게 봐서 결선투표라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결선투표의 이점은 제3, 제4 정당 출현의 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동시에 극단적 좌파나 우파가 장악하는 정당이 얼마 안 되는 표를 얻고도 최다 득표라는 이유로 당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세제, 초중등교육제도,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에 대한 저자의 언급은 더 래디컬하다. 그것은 좌파나 우파의 개념틀 속에서 래디컬한 것이 아니라 그 개념틀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중도적이고 래디컬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신경제라는, 뉴딜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환경에서의 새로운 제도모색이다.
제안 하나하나는 시사에 관심이 많은 미국인에게 익숙한 것일 수 있다. 저자의 강점은 오히려 이런 제안을 미국의 제도가 발전해온 역사적 궤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데 있다. 가령 신경제하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해왔는가. 19세기에는 홈스테드 법안이 있었고 20세기에는 주택융자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었다.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이런 식이다.
로버트 라이히 전 노동장관은 뉴욕타임스의 서평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이 책은 밑바닥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는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레포츠]낚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사설]‘소극적 저항’으로 유혈사태 막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25227.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