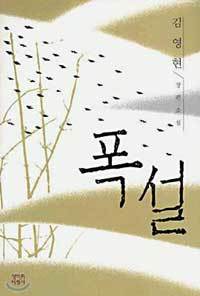
김영현의 장편소설 ‘폭설’은 나를 오랜만에 1980년대로 돌아가게 했다. 한때 후일담 소설이라는 것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행이라는 말에 걸맞게 씻은 듯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런데 장편소설 쪽으로 보면 작가 김영현이 ‘풋사랑’(1993) 이래 근 10년 만에 선보인 ‘폭설’은 ‘깊은 강은 멀리 흐른다’(1990) 이래 작가의 작품집에 붙어 다니는 상표답다. 여전히 후일담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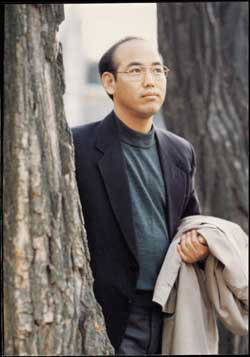
후기에서 작가는 “나는 내가 살아온 시대를 그리고 싶었다”라고 썼다. 언뜻 생각해 보면 철지난 발언처럼 들리다 못해 촌스럽다고 느껴질 법한 이 말을, 작품을 다 읽은 지금 나는 왜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폭설’은 ‘장형섭’이라는 운동권 젊은이의 이야기다. 그는 위장취업을 했다가 감옥에 갔다왔고 곧바로 영장이 나오는 바람에 입대했다 학교로 돌아온다. 그런 그에게는 ‘연희’라는 잊을 수 없는 여인이 있다. 제대 후 고향에 머물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그는 연희가 ‘열심당’이라는 비밀 지하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열심당이라는 종교적 비밀조직의 존재가 없었다면 ‘폭설’은 자칫 진부해질 뻔했다.
그러나 작가는 기독교적 취향과 도스토예프스키를 섭렵한 고전적 소양을 발휘하여 흔한 이야기를 흔치 않게 만드는 지혜를 발휘했다. 그리하여 ‘폭설’은 진실에 관한 물음을 내포한 후일담으로 완성되었다.
열심당의 일원이 된 연희는 ‘성유다’라는 조직 지도자의 애인이 된다. 연희를 잊을 수 없는 형섭은 그런 그녀의 존재 때문에 괴롭다. 과연 연희는 성유다를 사랑하는가? 자유 의지로? 나를 잊은 채? 그런 그녀는 성유다의 아이까지 임신했다가 죽음에 이른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김진성’이라는 정보기관 프락치를 살해한 것은 압제자들에 대한 저항과 응징을 모토로 삼은 열심당의 일원들인가, 아니면 그 조직에 누명을 덮어씌워 저항운동 세력을 무력화하고자 한 정보기관인가. 의혹은 깊어간다. 열심당의 수뇌 성유다의 떳떳하지 못한 과거와 정보기관 ‘박 부장’의 음험한 면모가 사실을 미궁에 빠뜨린다.
두 이야기를 둘러싸고 스토리는 부드럽고 섬세하면서도 긴장감 있게 펼쳐진다. 좌절과 혼란을 통해 성장해 가는 주인공 형섭의 마음의 흐름이나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눈과 비의 이미지는 작가의 솜씨가 여전히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연희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처리한 부분이 걸릴 뿐이다.
오래 전에 풋사랑을 읽고 나는 작가 김영현의 소설혼을 염려했다. ‘짜라투스트라의 사랑’(1996)도 그러했다. 그의 이름을 지탱해 준 것은 ‘해남 가는 길’(1992)과 ‘내 마음의 망명정부’(1998)에 실린 단편들이었지만 그것으로는 그에게 기대를 품은 내 마음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다. 이제 ‘폭설’은 작가 김영현의 후일담 시대가 화려한 종막에 다다랐음을 말해준다. 나는 다시 작가의 내일에 주목하게 되었다.
방민호 문학평론가·국민대 교수
스타일 >
-

특파원 칼럼
구독
-

2030세상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