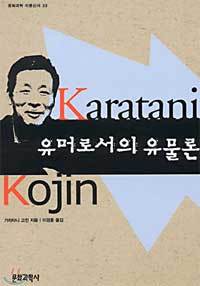
일본의 저명한 문예비평가인 저자의 책 중 국내에 처음 번역된 것은 1997년 민음사에서 나온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이다. ‘풍경의 발견’ ‘내면의 발견’ ‘아동의 발견’ 등의 낯선 주제로 일본의 근대를 분석한 글들은 큰 반향을 얻었고 이후 그의 책이 잇따라 국내에 소개됐다.
가라타니의 대표작을 꼽으라면 역시 ‘은유로서의 건축’(한나래)과 ‘탐구’(새물결)를 먼저 들지 않을 수 없다. 잡지 월간아사히는 93년 ‘일본을 아는 100권의 책’을 선정하면서 ‘은유로서의 건축’을 꼽고 포스트모던의 선구적 논문으로 평가했다. 산세이도(三省堂) 발행 일본고교 국어교과서의 문학사 연표에는 ‘은유로서의 건축’ 외에 ‘탐구’가 하나 더 들어 있다.
 |
그러나 외국인 독자에게는 철학서류의 이런 책들보다는 일본의 역사와 사상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이 훨씬 흥미롭다. ‘유머로서의 유물론’도 그런 점에서는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쪽에 가깝다. 특히 이 책은 80년 출간된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보다 훨씬 후인 99년 작품으로, 한층 예리해진 그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하이데거로부터 코제브, 바르트, 레비스트로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겐 일본이란 서양 외부의, 어느 곳에도 없는 장소(nowhere)이며, 그곳에 그들의 서구 비판이 투사되고 있다. 그 일본이 그들의 표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그것은 자명한 일이다. 일본인으로서도 일본은 중국이나 서양이라는 거울에 비친 표상이며, 그 경우의 중국과 서양은 어디에도 없는 장소이다.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장소를 통해 스스로의 문화를 비판하는 일은 자기 동일성을 확립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수단이다.”(‘푸코와 일본’중에서)
동양의 지식인들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비판을 들먹이길 좋아하지만 원래 인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가 저자는 묻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화제를 모은 ‘우리안의 오리엔탈리즘’(이옥순·푸른역사)이라는 책은 한국인이 보고싶은 인도만 보지 현실의 인도를 보지 못한다는 사이드식의 재치있는 비판을 담고 있다. 이런 비판은 가라타니의 눈엔 본질을 비켜간 것이다. 우리가 인도를 통해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인도가 아니라 거꾸로 그 안에 비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가라타니는 자크 데리다의 ‘그라마톨로지’로부터 에크리튀르(Ecruture)에 대한 통찰을 얻지만 메이지(明治)시대의 언문일치 연구를 통해 데리다를 뒤집는다. 음성중심주의를 데리다는 플라톤 이래의 서양 형이상학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지만 가라타니는 근대 민족의 형성과 분리할 수 없는 문제로 본다.
“우리는 너무 먼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아주 가까운 기원에서의 전도(顚倒)를 과거로 투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데리다처럼 플라톤주의로 소급하면 비교적 가까운 과거 또는 그 정치적인 전도의 과정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음성중심주의가 근대 서구에 나타났던 것은 전통적인 형이상학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적대시하는 운동에서 발생했다. 즉 라틴어에 대해 속어로 쓰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타났다.(중략) 단테 데카르트 루터 세르반테스 등이 쓴 언어가 각각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국어를 형성했던 것이다. 그것들이 각국에서 현재도 읽을 수 있는 고전으로 남아있는 것은, 각국에서 언어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역으로 그러한 작품을 통해 각 국어가 형성돼 왔기 때문이다.”(‘에크리튀르와 내셔널리즘’중에서)
저자는 17세기 유학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齊)의 주자학적 이(理)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 유불선(儒佛仙) 사상에 오염되지 않은 일본 고전의 해석을 통해 일본 국학을 완성한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 ‘실존’이란 번역어를 만들어내고 ‘이키(いき)’라는 독특한 개념으로 일본을 설명한 철학자 구키 슈조(九鬼周造), 선(禪)을 기반으로 해 서구 철학의 이원론을 극복하고자 한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郞), 소설가 요시모토 바나나의 아버지로 60년대 신좌익 학생의 우상이었던 평론가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 등을 종횡무진 오가며 일본의 근대, 혹은 동양적 근대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유머로서의 유물론’이라는 제목은 ‘푸코와 일본’ 등처럼 이 책에 포함된 14개의 글 중 하나다. 책 전체의 맥락과는 약간 동떨어진, 쉬어가는 짧은 삽화적인 글이 제목이 된 것이 유머러스하다고나 할까.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
인문사회 >
-

3시간의 행복, 틈새투어
구독
-

새로 나왔어요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