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양사 관련 번역서들은 대략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번역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 문제를 더 잘 알기 위해 책을 번역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이미 폭넓은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그 지식을 독자와 공유하기 위해 그 문제를 나름대로 잘 설명한 책을 골라 번역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역자가 그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여러 시행착오가 번역서에 담기게 마련이고 그래서 그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책의 뼈다귀를 뺀 나머지 세세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 독자가 책의 내용 구석구석을 다 읽은 다음엔 전체적으로 음미하면서 그 책이 주는 메시지를 되씹어보게 된다. 요컨대 이런 책은 번역서임에도 불구하고 맛을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푸짐한 역주가 달려있는 이 책은 단연코 후자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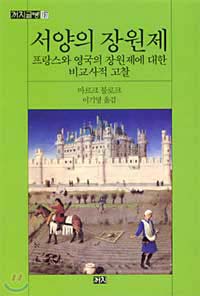
이 책은 저자인 마르크 블로크가 앙리 오제의 뒤를 이어 프랑스 소르본대 경제사 강좌 주임교수가 된 후 경제사 강의를 위해 1936년에 작성한 강의 원고이다. 다음해인 1937년에 저자의 유명한 ‘봉건사회’가 출판되었으니까, 말하자면 이 책은 ‘봉건사회’의 예고편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마르크 블로크의 모든 업적 가운데, 그리고 마르크 블로크라는 역사가의 숙달된 솜씨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것’(조르주 뒤비)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역사에 대한 저자의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는 점이다. 즉 저자는 왜 오늘날 프랑스는 중소 규모의 토지 소유와 대토지 소유가 병존하는 나라인 반면 영국은 철저하게 대토지가 우세한 나라인가라는 물음을 던진 후 이 현재적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 과거로 거슬러올라간다. 요컨대 현재는 과거에, 가끔은 아주 먼 과거에 크게 지배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연구대상인 장원제는 죽은 과거의 제도가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현재를 푸는 열쇠이며,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연구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둘째, 전체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저자에게 있어 장원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차원의 제도이지만 동시에 사회생활의 기본조직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같이 경제적 범주와 지배권적 범주가 결합되어 있었다는 것이 장원제의 특징이고 또 이 두 요소의 결합관계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매우 달랐기 때문에 저자가 목표로 하는 프랑스와 영국의 장원제에 대한 비교사적인 고찰은 양국 역사의 여러 측면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그 지식을 요리하는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게 된다. 요컨대 양국의 장원제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때로는 장원제를 밑으로부터 설명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위에서부터 설명해 내려가기도 하면서 프랑스와 영국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설명되는 장원제는 이보다 훗날에 벌어진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논쟁에서 제시된 장원제보다 훨씬 생생하고 입체적이다. 자본주의 이행논쟁에서의 장원제가 자본주의라는 거울에 비친 평면화된 장원제라면 이 책의 장원제는 현재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요컨대 ‘인간의 사회는 어릴 적 생긴 버릇의 영향을 받는 고령의 노인과 같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 책에서 우리는 장원제에 대한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이나 법제사적인 해석에서 볼 수 없는 장원제에 대한 보다 깊은 역사적 이해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저자가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시에 부정하는 프랑스 공화주의의 전통에 충실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서양중세사를 전공하지 않은 필자에게 이 책의 서평을 맡긴 이유도 아마 공화주의자로서의 마르크 블로크의 이런 면모 때문인 듯싶다.
원제 Seigneurie fran¤aise et manoir anglais
김인중 숭실대 교수·프랑스사
인문사회 >
-

기고
구독
-

정경아의 퇴직생활백서
구독
-

정용관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