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도 허가를 내주기 전부터 과열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정부 대책은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다. 그렇게 부작용이 걱정됐다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허가를 한 것은 로또복권이 정부에 가져다 줄 수익금 등 ‘단물’이 너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신종도박 자꾸 내놓는 정부▼
어디 로또복권뿐인가. 정부가 허가하는 도박산업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도박산업의 매출은 11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그것도 모자라 신종 도박을 자꾸 내놓고 있다. 지금도 경마장 카지노를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여기서 창출되는 정부의 수익금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국민에게 ‘병’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을 도박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분명히 해 둘 것이 있다. 도박산업의 성공이 반드시 도박의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이고 우리 의식수준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을 만큼 낮기 때문일까. 그렇지는 않다. 도박산업에 대한 수요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손과 손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도박산업은 레저와 도박의 두 얼굴을 지닌다. 도박산업의 성장은 여가나 오락에 대한 국민적 욕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산업사회가 일을 중시하고 여가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았던 반면 요즘은 일보다 오히려 여가를 중시하는 분위기다. 사행성 오락산업, 즉 도박산업도 이런 변화에 따라 무조건 부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시각에서 다뤄져야 한다.
만약 도박산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외국처럼 도박산업을 자율과 시장논리에 맡겨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의 무서움을 몸소 깨닫게 하고 나아가 ‘즐기는 대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아니면 규제조치를 통해 고삐를 어느 정도 조일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다. 앞의 것은 자기행동에 책임을 지는 ‘어른 사회’의 방식이며 뒤의 것은 ‘미성숙 사회’의 방식이다.
정부의 접근방식은 이율배반적이다. 한편으로 신종 도박을 계속 허가하면서 도박의 세부내용에는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경마장과 경륜장에는 10만원과 5만원의 베팅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정부가 얼마 이상은 돈을 걸지 말라고 계도하고 있느니 얼마나 자상한 정부인가. 하지만 이런 상한선 제도는 우리말고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로또복권에 대해서도 정부는 당첨금 이월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등 규제의 칼을 들이댔다. 이런 소심한 정부가 겁도 없이 새 도박을 계속 만들고 있으니 야누스의 얼굴이 따로 없다.
▼세계 공통의 ‘게임의 법칙'▼
이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자면 도박산업의 열매가 너무 달콤해 포기할 수는 없고 시장논리에 맡기자니 부작용이 겁나는 것이다. 정부가 모든 분야에 규제를 가해야 직성이 풀리는 개발 연대의 잔재도 엿볼 수 있다.
도박산업의 시장논리는 ‘도박은 자기 판단과 책임 아래’라는 세계 공통의 ‘게임의 법칙’이지만 우리 정서에선 낯설다. 규제에 익숙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박산업의 규제는 자신이 중독되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중독에 빠뜨린다. 반면에 시장논리는 도박의 해악을 보다 절실하게 깨닫게 해 줄 것이다. 어느 쪽이 바람직한가.
정부가 부작용을 걱정한다면 당장 모든 도박산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게 안 하려면 기존 도박산업에 대해서는 시장논리에 맡겨라. 로또복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고 내버려 두라. 당첨이 확률적으로 허황한 꿈이라는 사실은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게 낫다. 언제까지 국민을 어린애 취급할 것인가.
홍찬식 논설위원 chansik@donga.com
동아광장 >
-

사설
구독 791
-

고양이 눈
구독
-

e글e글
구독 99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1개
![[동아광장/송인호]전세대출 보증 축소, 임대차 시장 선진화의 첫걸음 돼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25/02/14/131036280.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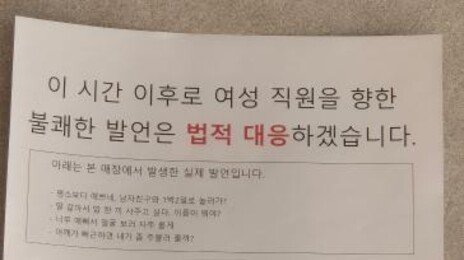
![[이기홍 칼럼]탄핵되든 복귀하든 윤석열은 보수 재건의 중심이 될 수 없다](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124483.1.thumb.jpg)

댓글 0